문학평론가 권택영 인문교양서 '생각의 속임수'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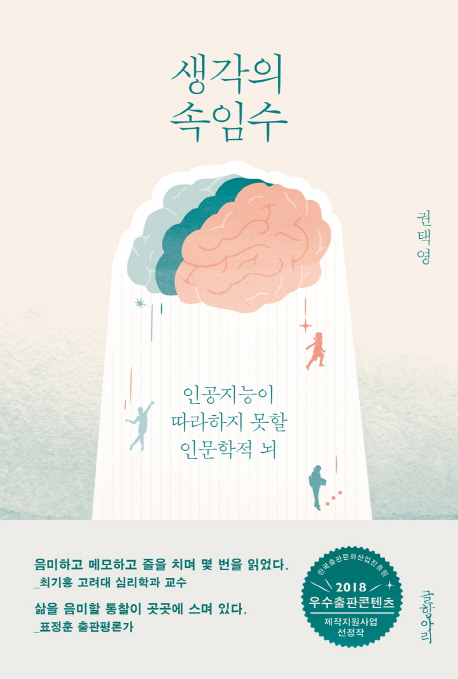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사랑, 집착, 고독, 공감 등 인간 삶의 중요한 감정과 의식의 실체를 인문학과 뇌과학을 동원해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 나왔다. 영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권택영 경희대 명예교수가 펴낸 책 '생각의 속임수'(글항아리).
라캉을 번역해 정신분석을 소개했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바이오 휴머니티: 인간과 환경의 경계를 넘어서' 등을 집필한 저자는 이번에 낸 책에서도 인간 두뇌의 감각과 의식 구조를 쉽게 풀이하며 로봇의 뇌(인공지능)가 어째서 인간의 인문학적인 두뇌활동을 그대로 모방하기 어려운지 이야기한다.
저자는 인간의 뇌를 '의식'이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각'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감각은 먼저 자리 잡은 뇌의 핵이고 의식은 이 핵을 둘러싸고 진화해왔는데, 감각과 의식의 이중 구조 때문에 우리 뇌는 이야기를 꾸미는 천부 능력을 타고난다는 것이다. 저자는 특히 의식의 영역이 감각과 기억의 왜곡으로 객관성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본 것, 기억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속임수'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정확히 되새기는 게 아니라 추억을 더듬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경험의 저축"에서 끄집어내는 기억에는 허구가 깃든다.
또 이런 기억에서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것'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뇌의 하부 구조,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 예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그는 결혼하고 얼마간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어른들이 아무리 다정하게 대하고 깊은 배려를 해줘도 늘 변비를 앓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남편과 주말에 근교 야산을 나가면 언제나 급한 신호가 찾아왔다고. 의식은 편안하다고 속이려 해도 몸은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뇌의 하부가 상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인간이 겪는 사랑의 감정을 봐도 이해할 수 있다.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 '애러비'에서 주인공 소년은 한 누나를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을 단념하려고 노력할수록 그의 몸은 반대로 더 활활 타오르고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사랑이 그토록 힘든 것은 내가 하는 말과 내 몸이 원하는 감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자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관해서도 조언한다. 고립은 인간의 내적 에너지를 한쪽에 고이게 하면서 인생을 사막같이 만들어버리므로, 타인이라는 오아시스가 필요하다. 타인에 대한 따스한 친근감이 없다면, 그날 일어난 일들은 기억에 저장되지 않고 흩어져버린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과거의 기억이 없으면 현재도 없어지고 마음의 저장고는 텅 비게 된다. 그러나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만큼 적정한 거리 두기도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타인과 거리감이 없으면 집착을 낳는다. 특히 부모의 사랑이 이런 집착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타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속의 또 다른 나를 받아들이는 관용을 의미한다. 자의식은 전혀 없으면 양심에 털이 나는 것이고 지나치면 고독의 성에 갇히게 된다. 이런 양면성 때문에 너무 어울려도 안 되고, 너무 안 어울려도 안 된다. 너무 어울리다 보면 세상이 너를 삼켜버리고, 너무 안 어울리면 술이 너를 삼킨다." (86쪽)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