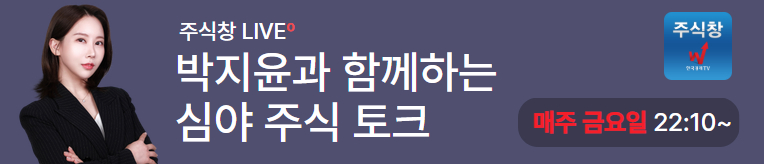분담금 5년간 40% 증가…재활용업계 "턱없이 부족"
독일, 제조사가 제품회수 책임…회수전담 회사가 맡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폐비닐·폐스티로폼·페트병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해법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경부는 폐비닐· 페트병 등 재활용 비용 증가에 따른 수거 적체 품목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기업들이 내야 하는 EPR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재활용 업계의 수거 거부가 잇따르자 EPR 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PR은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생산자 책임 원칙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예치금을 받는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해 2003년 본격적으로 EPR를 도입했다.
제품 생산자들은 EPR에 따라 정부가 정한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자가 내는 EPR 분담금은 2014년 1천억7천만 원에서 올해 1천424억3천500만 원으로 5년간 40%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 돈을 지원받아 실제 재활용을 하는 업계에서는 생산자의 분담금이 여전히 적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올해 재활용 회수·선별업체 170여 곳에 247억 원, 폐비닐을 최종 처리하는 고형연료(SRF)·물질재활용(MR) 업체 100여 곳에 279억 원의 지원금을 할당했다.
이 중 SRF와 MR업체는 연초에 처리량에 따라 계약을 맺어 금액을 지원받는데 처리량이 많아 벌써 상반기분 지급이 끝난 상태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원순환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EPR 분담금은 선진국보다 훨씬 적다"면서 "40% 넘게 늘었다지만, 거둬들여야 할 재활용품도 늘어난 만큼 생산자들이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제조사가 판매한 제품을 회수까지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DSD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제조사들이 공동 설립한 DSD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방식이다.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특히 재사용 유리병에만 보증금이 부과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페트(PET) 재질의 음료용기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은 EPR 운영 조직에서 재활용품 수거함을 직접 제작해 배출처에 비치하고 회수까지 책임지고 있다.
선진국처럼 기업의 책임을 늘리는 방안으로 EPR 분담금 증액 카드가 논의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 증가가 발생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그동안 기업이 내온 분담금이 얼마나 제대로 재활용에 쓰이느냐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문가는 "선진국은 EPR 운영 조직의 몸피를 줄여가면서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대신 EPR 분담금을 최대한 재활용에 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조직 크기를 줄여 분담금을 제대로 쓰게 해야 기업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