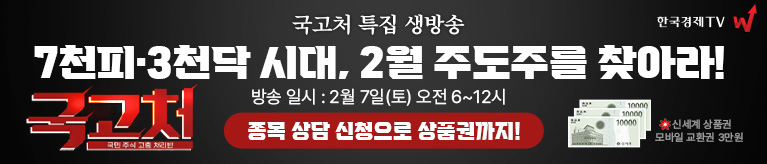평창外 사안 논의는 불투명…'9일 고위급회담' 北 수용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으로 남북이 4일부터 우리가 제안한 회담 개최와 관련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협상 국면이 본격 시작된 셈이 됐다.
일단 관심은 어떤 형식의 회담에 남북이 합의할 것인가에 모여진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넘어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폭넓은 논의까지 이뤄질지가 관심이기 때문이다.
회담의 형식은 의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실무회담이냐 고위급 회담이냐에 따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제의한 건 고위급 당국회담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회담제의 회견에서 일차적으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논의에 주력하겠다면서도 "당국이 서로 마주 앉게 된다면 여러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은 3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해 회담 개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판문점 연락채널 개통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에 의제를 한정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초반에는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체육실무회담 형식으로 남북대화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대표단 참가만 해도 논의할 것이 적지 않다. 일단 선수단과 임원진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군사분계선을 넘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안고 육로로 내려올지, 아니면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할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육로 입국이 추진된다면 이를 위해선 남북 군사당국 간 연락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끊어진 군 통신선 복원과 군사당국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다.
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 평화의 또 다른 상징이 될 수 있는 개·폐회식 남북 공동입장도 논의 대상이다. 남북은 2007년 창춘(長春) 동계아시안게임 이후 10여년간 주요 국제체육행사에서 공동입장을 하지 않았다.
피겨 팀이벤트와 여자 아이스하키 등의 종목을 대상으로 한 남북단일팀 구성도 논의될 수 있지만 올림픽까지 40일도 남지 않은 데다가 단일팀 구성시 일부 우리 선수들의 출전이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응원단이나 예술단까지 파견할 경우 대표단과 더불어 입국 경로와 숙소, 안전보장 등의 문제가 협의돼야 한다.
북한이 참가비용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미 북한의 참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우리 쪽에서도 과거 남쪽에서 열린 국제경기에 북한이 참가할 때 그랬듯 남북협력기금으로 체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YNAPHOTO path='AKR20180104038000014_03_i.jpg' id='AKR20180104038000014_0301' title='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오른쪽)과 반다비' caption=''/>
그러나 우리가 제안한 대로 고위급 당국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아직 우리측의 고위급 회담 제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고위급 회담이 열려 장관급이나 차관급 수석대표가 회담 테이블에 앉으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넘어 그간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과 관련해 폭넓은 논의를 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 우리측은 지난해 7월 제안했지만 아직 북측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한 적대행위 중지와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판'이 커지면 남북 양측이 부담스러워하는 사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북측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우리 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각각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편 우리 쪽에서 고위급 회담 시기로 9일을, 장소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을 제시한 데 대해 북한이 수정제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회담의 형식·시기·장소에 대한 북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