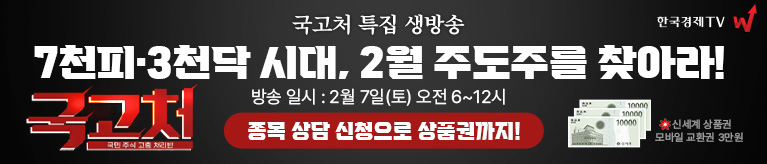스포티파이·드롭박스 등 데뷔 준비…"우버·에어비앤비는 내년 이후"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일 보도했다.
미국 IPO시장은 지난해 모처럼 활기를 띠었으나 대어급 IPO는 드물었고 올해도 이런 상황에는 큰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는 낙담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IPO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어나겠지만 에어비앤비, 우버, 위워크처럼 기업 가치가 높고 이름도 익숙한 비공개 기업들은 IPO를 내년으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짐 쿠니 미주 주식자본시장 부장은 "극히 부진했던 2016년을 보낸 뒤 정상의 회복을 분명히 목도했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다수의 대형 IPO는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딜로직에 따르면 2016년의 IPO는 111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조달한 자본은 242억 달러에 그쳐 2003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모두 189개의 기업이 IPO를 통해 2016년의 2배를 넘는 493억3천만 달러의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IPO시장의 주축을 이루는 IT기업들의 지난해 기업공개는 37건, 공모액은 124억6천만 달러였다. 이는 26개 기업이 43억 달러를 공모했던 2016년과 비교하면 근 3배에 달하는 성과였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지난해 IPO시장에서 쓴맛을 봐야 했다. 지난해 3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상장했던 스냅의 주가가 반짝 상승한 뒤 줄곧 공모가(주당 17달러)를 밑도는 바람에 많은 투자자에게 평가손을 안겼고 IPO에 대한 경계심을 높였을 뿐이다.
오히려 대규모의 펀딩은 사모시장에서 활발한 편이었다. 스냅의 공모액은 39억 달러로, 2014년 알리바바 이후 최대였지만 위워크가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로부터 출자받은 44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슬랙 테크놀로지와 핀터레스트처럼 통상적으로는 IPO를 추진했을 만한 비공개 기업의 상당수가 IPO시장을 외면하고 사모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모건스탠리의 콜린 스튜어트 글로벌 자본시장 담당 부회장은 대형 IPO가 부진한 배경에 대해 기업과 이사진이 IPO에 나설 적기인지, 충분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올해 IPO시장에 대어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유명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는 오는 3월이나 4월에 기업공개에 나설 예정이다.
2014년 마지막으로 펀딩을 실시할 당시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로 평가던 드롭박스도 IPO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3월이나 4월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가정보안 회사인 ADT도 같은 시기에 증시 데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티파이는 뉴욕 증권거래소 직상장을 택해 IP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상장은 사전 공모를 통해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보유주식의 현금화 기회를 제공할 뿐이며 신규 투자자들은 일단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나 이 회사 주식을 살 수가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드롭박스의 공모액은 2014년 펀딩 당시의 기업가치와 거의 같거나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ADT의 공모액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과 업계 관측통들은 우버의 IPO가 연내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대 경쟁자인 리프트는 하반기에 IPO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IPO를 마친 기업들의 주가는 시장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21%로 같은 기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의 19%보다는 약간 높았다.
그러나 스냅과 식재료 배달업체인 블루 에이프런의 IPO는 실망을 안겨주었다. 블루 에이프런의 지난해 6월 공모가는 당초 회사측이 원한 15~17달러를 밑도는 10달러였고 현재는 공모가의 절반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공모주 매수에 신중을 기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통적인 기업가치 평가 척도로 보더라도 다수의 고성장 IT기업의 공모가는 비싼 편이라고 덧붙였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