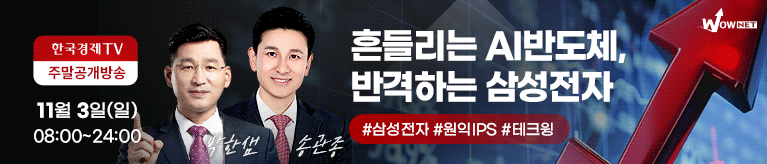개명·정관개정 위한 총회 등 일정도 못잡아…깊어가는 불안·고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입지가 크게 좁아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6일 창립 56주년을 맞았다.
전경련 임직원들은 이날 창립 기념행사를 치르지 않고 조용히 휴무일을 보냈다.
한 5년차 전경련 직원은 "입사 이후 예년에도 특별한 창립 행사는 없었기 때문에 외견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혹시 마지막 창립 기념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 모두 무거운 마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1961년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주도로 창설된 대기업 경제단체 전경련은 이후 지난해까지 반세기 이상 '재계' 대변인 역할을 맡아 왔다.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경제·경영단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재계 목소리를 전하고, 그만큼 영향력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검찰 및 특검 수사 결과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이 대기업 자금을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경련의 위상은 바닥까지 추락했다.
여론 질타 등 영향으로 지난해 말 215명이던 임직원 수가 현재 110명 정도로 40% 넘게 줄었다. 자발적 이직과 계약 만료뿐 아니라 '희망퇴직' 형태로도 수십 명을 내보냈다. 남은 임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 혜택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를 계기로 삼성, 포스코, 현대차, SK, LG 등 회원들이 잇따라 탈회하면서 몸집(회원사 수)도 600여개에서 400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서 소통을 주도하던 '재계 대표' 역할도 상공회의소에 빼앗겼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동행할 방미 경제인단 구성, 대통령-경제인 간담회 준비 등을 모두 상공회의소가 도맡아 진행했다.
전경련은 이름을 '한국기업연합회'로 바꾸는 등 정관 변경을 통해 '부활'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 새 정관을 심의·의결할 이사회나 총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형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당초 이름 변경 등 정관 개정 작업을 4~5월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주무부처인 산업부 인사 등이 예상보다 늦어져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제 인사는 마무리됐지만, 추석 연휴와 국감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이사회나 총회 날짜를 잡기가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재계에서는 산업부가 정관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동안 법인 설립 목적 외 사업으로 공익을 해쳤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설립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전경련의 불안과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