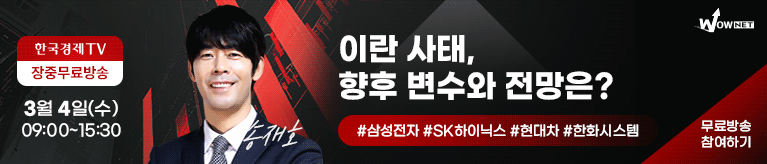(서울=연합뉴스) 권훈 기자 =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 경기가 열린 바하 다 치주카 올림픽 골프 코스는 한때 브라질 골프 중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브라질골프협회 파울루 파헤쿠 회장은 리우 올림픽 골프장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브라질에서 골프는 극소수만 즐기는 운동이다.
브라질 국민 2억명 가운데 골프를 치는 사람은 2만 명에 불과하다. 인구 3억명의 미국에서 골프인은 2천만 명을 웃돈다.
리우데자네이루에는 600만명이 살지만,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고작 1천500여명이다.
리우 올림픽 골프장은 세계적인 골프장 디자이너 길 핸스가 설계한 명품 코스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는 올림픽이 열리기에 앞서 코스 관리 전문가 4명을 무려 110차례 출장을 보내 코스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놨다.
올림픽이 끝난 뒤 브라질 최초의 18홀짜리 퍼블릭 골프장으로 거듭난 올림픽 골프장이 브라질 골프 중흥의 마중물이 되리라는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기대했던 골프 열기는 살아나지 않았다.
1천500명에 불과한 골프 애호가들도 리우 올림픽 골프장을 찾지 않는다.
9만원에 이르는 그린피를 감당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AFP 통신은 "골프장은 텅텅 비었다"는 현지 르포 기사를 내보냈다.
운영난에 빠진 리우 골프장은 심지어 코스 유지·관리 직원 임금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몰렸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자 코스는 엉망이 됐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만든 코스라 유지·관리가 중단되자 금세 황무지로 변해갔다.
보다 못한 국제골프연맹(IGF)가 나섰다.
최근 피터 도슨 IGF 회장은 브라질로 날아가 리우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긴급 자금이 수혈됐다. 코스 관리 직원들은 다시 출근해 코스를 돌보기 시작했다.
도슨 회장은 "급한 불은 껐다. 두달 전만 해도 회생에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나아지지 않겠나"고 안도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한 달에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씩 소요되는 코스 유지·관리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IGF가 계속 이런 비용을 계속 댈 수는 없다. 도슨 회장 역시 "리우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일시적인 도움뿐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림픽을 개최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PGA투어 역시 발을 빼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PGA투어 신인 커미셔너 제이 모나한은 골프채널과 인터뷰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하지만 솔직히 해결책이 없다"고 털어놨다.
리우 올림픽이 남긴 '하얀 코끼리'는 리우 올림픽 골프장뿐 아니다.
'하얀 코끼리'는 '돈만 많이 들고 쓸모없는 물건'을 뜻한다.
USA 투데이는 최근 개막식과 폐막식 장소였던 마라카낭 경기장 역시 아무런 용도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근대5종 경기와 럭비 경기장으로 사용하다 시민 공원으로 바뀐 데오도루 올림픽 파크는 아예 폐쇄됐다.
일각에서는 리우 올림픽 골프장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유는 씁쓸하다.
원래 자연 상태였기에 방치하면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kh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