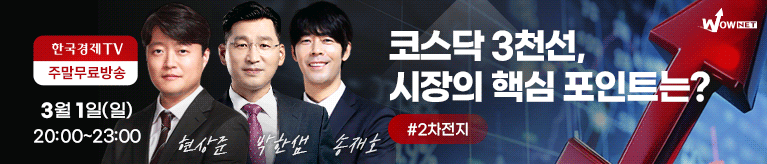미국의 비자 심사가 지연되면서 구글과 애플이 외국인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구글의 외부 법률자문을 맡은 BAL 이민법률사무소는 최근 직원들에게 미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도장 발급 예약이 길게는 1년까지 밀리고 있다며, 해외 체류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출국을 피하라고 안내했다
애플의 자문사 프래고먼도 애플 직원들에게 "유효한 비자 도장이 없는 직원들은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여행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애플 이민 담당팀이나 자사와 연락해 논의해야 한다"는 메모를 보냈다.
이 같은 권고는 미국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검증 요건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 비자 심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도 온라인 활동 검토를 포함해 비자 심사를 한층 강화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비즈니스인사이더에 "과거에는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은 무엇보다 각 비자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애플과 같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은 해외의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 H-1B 비자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을 위한 비자로,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 건으로 제한돼 있는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 이 비자를 5천537건 신청했고 애플도 같은 기간 3천880건의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등 미 보수진영에서는 이 비자가 인도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해당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100배 증액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들은 당시에도 직원들에게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는 유사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