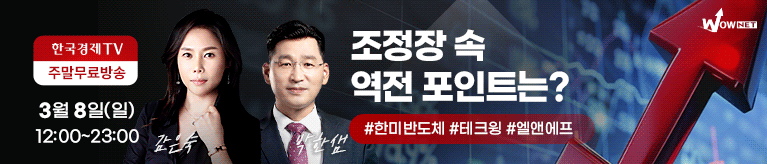제약사들이 영업을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의대 정원 문제로 인센티브까지 줄자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유유제약은 최근 약국·의원 영업 부서를 폐지하고 영업대행업체(CSO)에 업무를 맡겼다. 경동제약, 안국약품, 명문제약 등도 CSO에 영업을 맡기고 있다.
CSO는 제약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제약사 대신 제품을 팔아주는 업체로, 의약품 공급업자에 속하지 않아 운영이나 설립 등에 제약이 덜하다.
업계 관계자는 "CSO를 활용하면 내부 직원을 고용할 때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영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출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체들이 CSO에 맡기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영업보다 마케팅 등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목적도 있다.
제약사들은 영업 과정에서 병의원들에 현금성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자주 휘말리곤 하는데, CSO에 맡기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리베이트 제제 강화를 예고해 CSO에 맡기는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직접 영업을 하는 제약사에서도 영업사원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은 의료진에게 제약사 영업 인력의 병원 출입을 금지하라는 내부 공지를 띄웠다.
영업사원들은 기본급 외에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 이 인센티브가 기본급보다 클 때도 있다. '큰 손'인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니 인센티브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대형 종합병원들의 진료와 수술 등이 줄어든 점도 문제다.
한 중견 제약사 영업사원은 "전공의 파업 이후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고 외래 환자도 안 보게 되면서 주사제뿐 아니라 경구제의 매출도 매우 낮아졌다"며 "병원 앞 약국들은 어려움이 큰데 회사는 매출 목표치를 수정해주지 않아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의약품 판매 실적이 줄어드니 인센티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회사에서 영업 부서에 할당하는 예산도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