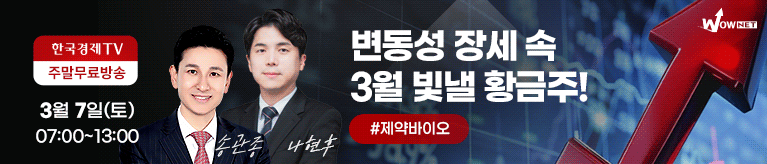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논의에 속도가 붙자 의학교육계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적정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증원 수요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현장 조사에 돌입할 예정인데 정부가 이 과정에서 교원과 인프라 등 현실적인 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원 시 실제 학생 교육을 맡는 곳은 의과대학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논의에 더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이사장은 1987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로, 서울대 의대에서 기획조정실장과 교무부학장, 학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회원으로 둔 KAMC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증원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와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적정 규모는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교원과 인프라 등 다양한 면모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최근 의대 교육이 '소규모 그룹 토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환자의 전형적 증상과 진단을 학습하는 걸 넘어 실제 환자를 보는 경우를 가정해 소규모로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수업이 늘고 있어 더 많은 교원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강의실에 의자 10개를 더 넣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대형 강의실보다 소그룹 교육을 위한 토의실을 확보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면 당장 교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초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1.6명을 담당하고 있어 증원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신 이사장은 이 역시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버드대 의대는 학생이 700여명인데 교수가 1만명이 넘는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적은 편"이라며 "의학 교육의 특성을 생각하면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판단하거나 비교할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상은 몰라도 기초의학 교육을 담당할 교원이 부족하다"며 "최근에는 비(非)의사 출신인 의생명과학자 등이 기초 교육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들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신 이사장은 의대 교육의 특성상 실습·임상 등에 들어가는 재원이 크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육에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증원 규모를 따질 때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늘어난 학생으로 인한 등록금 수입만 생각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 한정된 자원을 나눠서 가르쳐야 하므로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현실적 여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