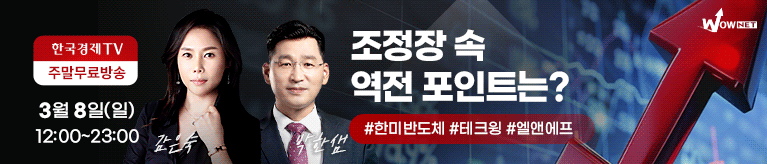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자산을 고려해도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노인세대 중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더 심각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 준비 방안이 연금보다는 자산, 특히 부동산을 활용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노인 빈곤 현황을 분석했다.
귀속임대료(자가 소유자가 자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금액) 등을 포함한 포괄소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연금화했을 때의 소득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포괄소득화를 했을 때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4.8%로 독일(11.8%), 영국(9.8%), 미국(10.8%·2016년 기준) 등 주요 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연금화했을 때도 노인빈곤율은 26.7%로 미국(9.0%·2016년 기준), 독일(10.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노인빈곤율(42.3%)보다 자산을 고려했을 때 빈곤율이 더 낮아지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2018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회원국들의 노인 빈곤율은 평균 13.1%였다.
아울러 노인 빈곤의 정도는 고령일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과 자산(포괄소득)을 고려해 고령층을 저(低)소득-저자산, 저소득-고(高)자산, 고소득-고자산, 고소득-저자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저자산 비중은 2021년 기준 1930년대 후반 출생에서 45.9%였다.
1940년대 전반 출생은 37.2%, 40년대 후반 출생은 31.6%, 1950년대 전반 출생은 19.7%, 1950년대 후반 출생은 13.2%로 일찍 태어난 세대일수록 취약계층 비중이 높았다.
세대별로 취약계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배경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 격차의 차이,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등이 꼽힌다.
가령 1945년생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0세 시점에 613달러인데, 1950년생은 1천699달러로 약 3배 차이가 난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저소득-저자산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처럼 고령층의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할 시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적이전소득을 지원할 때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축소 등을 통해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