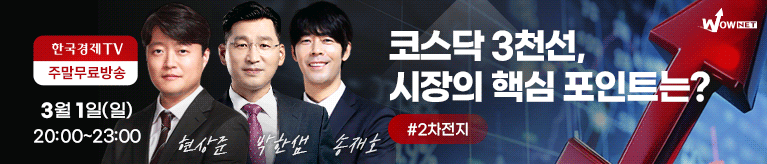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의 탐욕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을 가격을 올릴 구실로 이용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소비자가 경쟁사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가격 인상 폭을 결정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례적인 사태가 전혀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폴 도노반 UBS 글로벌 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기업들도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인다는 쪽에 베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도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와 에너지 가격 상승 탓에 모든 상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다.
또한 최근 공급망 붕괴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특정 기업이 아닌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경쟁 기업의 눈치를 볼 필요도 적어졌다.
이사벨라 웨버 매사추세츠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의 가격 결정 구조를 전혀 다른 시점에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 경쟁 기업도 가격을 따라 올릴 것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과도한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이 생산비 인상 폭만 상품 가격에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위스의 다국적 건축자재 기업 홀심의 최고경영자(CEO) 얀 필리프 예니슈는 최근 기업실적 설명회에서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품가격을 인상했다는 점을 설명한 뒤 "경영에 부정적인 결과가 아닌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기업들의 행태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다.
독일의 대형 유통업체 에데카는 최근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일부 업체들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UBS의 도노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성비가 나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기업들도 상품가격 인상에 대해 접근법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