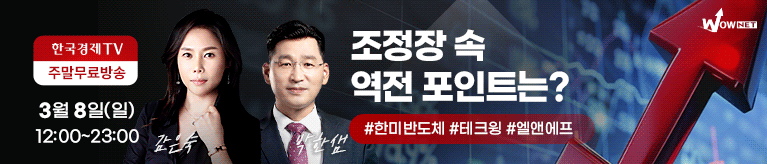국제유가 급등과 원화 가치 급락(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체감 유가가 이미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은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 현물 가격(싱가포르 거래소 기준)은 지난달 31일 기준 배럴당 88.39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10월 배럴당 84달러 선까지 올랐던 두바이유 가격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7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두바이유 가격이 이처럼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7년 3개월만이다.
하지만 이는 달러로 살 수 있는 유가일 뿐 우리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유가는 원화로 환산해 봐야 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보면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87.58달러, 원/달러 환율은 1,205.5원이었다. 배럴당 가격은 10만5천577원이 된다.
배럴당 가격이 이런 수준을 기록한 가장 가까운 시점은 2014년 8월12일이었다. 당시 유가는 배럴당 103.25달러로 100달러를 넘었다. 원/달러 환율이 1,026.4원으로 지금보다 180원 가까이 낮다 보니 원화로 살 수 있는 원유량은 87.80달러인 지금과 103.25달러인 당시가 같은 상황이 된다.
유가를 31일 기준(88.39달러)으로 적용하면 배달당 가격이 10만6천554원으로 더 높아진다. 쉽게 말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는 것이다.
유가와 환율이 함께 오르는 현상은 역사상 이례적이다.
대개 고유가 시대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여왔지만,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도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 초반이다 보니 체감 유가는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연준의 강력한 매파 기조 전환이 겹치면서 나타났다.
유가가 올라가도 원화가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고유가를 덜 체감하지만, 유가가 오른 가운데 원화마저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로 가면 고유가 여파를 할증해서 받는 구조다. 즉 유가로 불이 붙은 가운데 환율로 기름을 뿌리는 격이다.
미국 연준은 올해 5회 이상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최근 시사했다. 특히 물가 지표가 4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만큼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이처럼 금리를 인상하면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미국과 러시아의 자존심 싸움으로 전개되는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단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우크라이나 침공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까지 뒤얽히면서 지정학적 위기 국면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아랍에미리트(UAE) 석유 시설 드론 공격 역시 유가를 흔드는 악재다.
이처럼 뒤엉켜버린 유가·환율 악재는 결국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유가 오름폭에 환율 변수까지 더하면 휘발유 가격은 다시 ℓ당 1천8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유류세 인하에도 최근 최고가인 11월 둘째 주 ℓ당 1천807.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구나 유가는 각종 제품의 원재료 성격인 만큼 국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설을 앞두고 정부가 누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이달부터 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월에는 3% 후반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더라도 2월 이후에는 유류 가격 상승과 농·축·수산물 상승 압력, 개인 서비스·가공식품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4%대에 근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3.8%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12월에 3.7%로 소폭 둔화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강세 등 영향으로 상반기에 상승하다 점차 오름폭이 둔화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