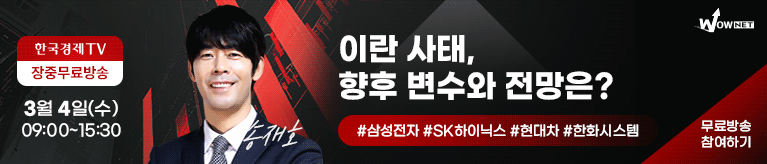누구나 쉽게 가입해 소식을 주고받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1세대 SNS가 등장한 지 벌써 10년이나 됐습니다.
세대교체의 시작일까요. 요즘 떠오르는 SNS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까다로운 가입 절차와 내밀한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누구나 쉽게 가입해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한 지 벌써 10년.
급격하게 늘던 이용자수는 최근 들어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대신 ‘우리끼리’를 앞세운 폐쇄적 플랫폼이 뜨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출신끼리만 소개팅을 주고받는 앱 들이 잇따라 나오는가 하면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당근마켓 같은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블라인드는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가입할 정도입니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등 유명 인사들의 발언대로 주목받은 클럽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에 필수인 초대장이 비싸게는 만 원이 넘는 값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 만큼 까다로운 인증이 필수, 보안 시스템에도 공을 많이 들입니다.
[ 사영준 /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공개적인 SNS는 불필요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미디어 기능 분화현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이 몰리는 만큼 광고가 붙고 벤처투자도 잇따릅니다.
일촌이라는 특별한 관계 설정으로 싸이월드가 성장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단순 신상공개를 넘어 뚜렷한 이용목적을 갖고 있는데다 이용 상대방을 서로 잘 모른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사생활 공개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공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