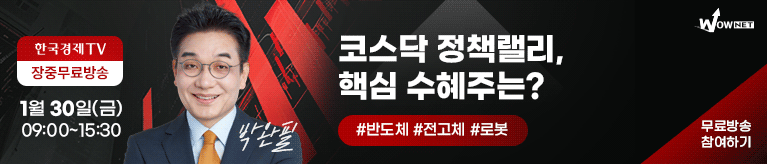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의 첨단 정보기술(IT) 메카인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와 금융 허브인 뉴욕에서 대표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이뤄지고 있다.
먼저 텍사스주 오스틴의 `실리콘힐스`(Silicon Hills)나 플로리다주는 IT기업과 금융사들의 새로운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상징인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새너제이의 본사를 텍사스 휴스턴으로 옮긴다고 밝혔다.
빌 휴렛과 데이비드 패커드가 주차장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1938년은 실리콘밸리의 기원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HPE의 본사 이전은 첨단 산업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의 흔들리는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수일 뒤에는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본사를 실리콘밸리 레드우드시티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데이터 분석업체 팰런티어 테크놀로지는 이미 8월 본사를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서 콜로라도 덴버로 이전했다.
기업인들의 이탈도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팔로알토에 테슬라 본사를 두고 있던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로 이사했다.
그는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점 등을 이사 이유로 설명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캘리포니아의 소득세율이 13.3%로 미국에서 가장 높지만 텍사스는 주 차원의 소득세가 없다며 머스크의 절세를 주요 목적으로 추정했다.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도 주거지를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와이주 라나이섬으로 옮겼다.

월가가 있는 금융허브 뉴욕에서는 대표적인 금융사들의 이탈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12월 뉴욕에 본부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핵심 조직인 자산운용 사업부를 플로리다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플로리다주 남부에서 새 사무실을 물색 중이며 주당국과 세제 혜택 등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도이치방크가 4천600명에 달하는 뉴욕 맨해튼 근무자 중 절반 정도를 다른 도시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작년 10월 미국 매체들은 행동주의 사모펀드로 유명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21년 본사를 뉴욕 맨해튼에서 플로리다의 웨스트 팜비치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 폴 튜더 존스, 데이비드 테퍼 등도 사무실을 이미 플로리다로 옮겼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과 헤지펀드인 시타델도 플로리다주로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뉴욕이나 실리콘밸리를 떠나는 기업 이주 행렬의 원인으로는 높은 세금과 비싼 물가 등 불리한 기업 경영 환경이 꼽힌다.
미 경제 매체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법인세는 8.84%이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13.3%에 달하는 반면 텍사스주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으며 법인세 대신 약 1%의 영업세(franchise tax)를 부과한다.
플로리다주는 현재의 금융 허브 뉴욕과는 달리 개인소득세나 자본이득세 등이 없는 점이 장점이다. 또 금융사들로서는 주요 영업 타깃인 부유층 은퇴자의 유입이 많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현재 실리콘힐스에는 이미 IBM과 페이팔, 오라클, 델, AMD 등 굴지의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실리콘밸리의 명성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다.
벤처 캐피털 회사인 아토믹의 J.D. 로스는 "오스틴은 스마트 시티"라면서 "모든 것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고, 공항 게이트도 매년 새로 추가되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지역 분위기를 소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