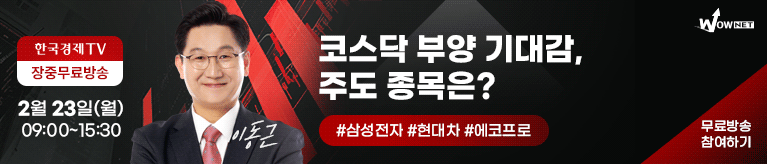'잃어버린 20년'
우리나라도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수년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대응책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 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이른바 'L자형 불황'이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신용훈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1985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던 일본.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주가와 땅값은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자료:한국은행)
이에 일본 정책당국은 1989년 급격한 금융긴축정책을 추진했고, 1990년에는 부동산 대출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자산 거품은 가라앉았지만, 대규모 부실 대출을 떠안은 금융기관이 민간대출을 줄이면서 실물경제는 침체됐고 소비자 물가하락과 소비위축, 기업 투자 위축의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소비 침체와 부동산 가격 폭등, 대출 옥죄기 등 최근 우리나라의 모습은 일본의 불황진입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 앞에 닥친 장기불황을 막을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의 해소와 노령화 등 사회구조적인 측면 외에 소비진작, 고용확대, 기업투자 등 산업적인 측면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산업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변수에 여전히 취약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원복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차산업 혁명도 있고 여러 가지 신산업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볼 때는 산업경쟁력 회복이나 산업 재편 관점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맞지 않나"
과거 IMF와 금융위기 당시 유동성 위기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산업재편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재편의 방식으로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산업 생태계에 안착시키는 안이 거론됩니다.
기존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채권단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부담하고 여기에 사모투자펀드(PEF) 자금과 M&A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두 제도의 장점을 합한 이른바 'P-Plan'을 활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구조조정의 방향성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구조조정이 위기탈출과 기업의 존속을 주목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자산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