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융가에서는 돈 이야기가 아니면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다.
미국에서 저렇게 많은 돈을 찍어냈는데...과연 돈 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겠냐는 것이다.
금을 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엄청난 달러가 새롭게 인쇄되어 나오는 상황에서도 막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달러의 비결이 뭘까?
오늘부터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야기에 앞서...일단 어렵지만 경제 이론 한 가지를 소개해보자.
많은 경제학자들이 거론했던 이론 중에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이 있다.
<케인즈>라는 천재가 화폐 현상에 대해서는 가장 잘 설명한 것 같다만...그 이전에 <리카르도>가 먼저 말을 꺼냈었고 그로부터 한참 후에 <알프레드 마셜>이나 <어빙 피셔>와 같은 경제학자들이 보기 쉬운 방정식으로 표시를 했었지.
MV=Py 로 표시되는데...경제 학도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정식이지만 너는 전공이 다르니 굳이 바르게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화폐수량설과 관련한 복잡한 것들은 빼고 이 공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물가와 통화량과의 관계가 될 것이다.
M은 돈의 양이고 P는 물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는 만큼 1:1의 비율로 물가가 함께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지...
배추가 많아지면 배추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형성 원칙이라면...돈을 많이 찍어내서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당연하다.
얼마 전 짐바브웨를 거론한 적이 있었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1조 짐바브웨달러를 판매한 적이 있었다.
1조 라면 “0”이 무려 13개다. 지폐에 13개의 0이 그려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0 하나 더 붙어 있는지 덜 붙어 있는지 세어보는 것도 일이 될 것이다.
이쯤 되면 돈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돈이 죽어버려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제 역시 마비되게 되는데...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불 결제의 기능>과 <축재 기능>이다.
예를 들어볼까?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곡식으로 축재를 할 수 없으니 돈으로 대신 저축을 하게 되는데...모든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더 하락하기 이전에 뭔가를 바로 사야만 하는 강박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예금은 언강생심 꿈도 꾸지 못한다.
기업들은 개인들이 저축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개인들이 예금을 하지 않으니 이래저래 경제는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누군가 돈을 경제의 혈액이라고 했었던 것이다.
사람의 몸에서 혈액이 모두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살 수 없듯이 경제에서도 돈이 죽어버리면 그 경제는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지...
짐바브웨에서는 학교에서도 교육비를 돈으로 받지 않고 염소와 같은 현물을 받았는데...
상상해봐라...
지금 너희 등록금을 위해서...내가 직접 염소를 몰고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가서 실물로 납부해야만 한다면...경제적 낭비가 어디 시간뿐이겠니?
이런 일은 후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독일이 엄청난 경제국으로 성장해있지만 과거 1차 대전 직후 독일의 <바이마르>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일당을 하루에 두 차례 나누어 받았는데...이유는 반나절만 지나도 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오전치 일당을 받으면 그 즉시 식료품점으로 전력질주를 하곤 했는데...천천히 걷다 보면 그 시간 동안 돈의 가치가 더 떨어져서 같은 돈으로는 더 적은 빵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달랑 맥주 한 잔에 2000억 마르크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결국 누적된 지독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913년에는 버터 한 조각의 가격이 무려 6조 마르크까지 올랐을 정도였다.
이렇게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따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시 독일에서는 달랑 하루 만에 물가 두 배 이상 뛰기도 했었는데...물건의 가치...즉 물가가 오르는 대신 돈의 가치가 하락하다보니 1조 마르크 정도의 현금 동원능력(?)은 어지간히 가난한 노동자에게도 어려운 일은 아닐 정도였고 동네에서 아이들이 돈 뭉치로 블록 쌓기 놀이를 할 정도였다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렇게 독일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발생한 이유도 짐바브웨와 다르지 않다.
당연히...화폐의 남발이 원인이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고 당시 중앙은행이었던 <라이히스방크>가(지금은 분데스방크) 그들이 발행했던 채권을 갚기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서 조달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돈을 마구 찍어내면 물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나같이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 돈을 마구 잡이로 발행해서는 안되겠지?
그래서...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함부로 돈을 남발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분리 독립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짐바브웨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은행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다 공정하게 물가와 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런데 말이다...
참 희한하게도...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전혀 먹히지 않는 곳이 있다.
<달러>는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찍어내고도 비교적 온전하게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어느 나라의 정부보다도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지만 달러는 오히려 양적완화를 거치면서 더 강해진 경우도 있었는데...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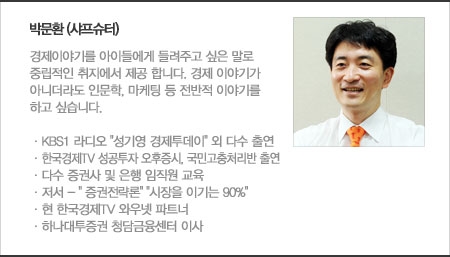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