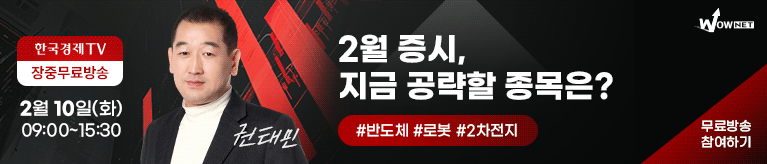주택은 우리 민생과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다. 집값이 불안정하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자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은 만만치 않다.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중에 살 집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주택은 우리 민생과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다. 집값이 불안정하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자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은 만만치 않다.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중에 살 집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설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
핵심은 ‘얼마나’가 아닌 ‘어디에’ 짓느냐다. 주택 문제는 단순히 공급 물량이라는 숫자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그동안의 대규모 신도시 공급은 도시 외곽에서 많이 이뤄졌다. 이는 장시간 통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교통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낳았다. 특히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은 이제 청년 세대의 취업과 결혼, 출산을 결정짓는 필수 기준이 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방안(1·29 공급 대책)의 핵심을 ‘도심 주택 공급’에 뒀다.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역세권이나 교통 요지에 집을 짓는 것이 도시 외곽을 확장하는 것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수도권 도심 요지에 약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7 대책’의 약속을 가시적인 결과물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 이행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사업의 걸림돌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지방정부와 협의해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이 있는 부지도 2027년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일부 지역의 교통 및 기반시설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기에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도심 주택 공급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청년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터전을 잡고, 마음 편히 가정을 꾸려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부담 가능한 주택을 꾸준히 늘려 주택시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데 매진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 이뤄지는 날까지 ‘말’보다 ‘실천’으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쏟아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