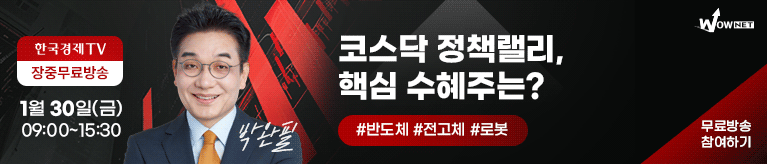"난색을 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차라리 미국으로 가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한 삼성전자 관계자의 말이다. 국가전략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면서 반도체 기업이 때 아닌 홍역을 치르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반도체도, 국가도 다 죽자는 얘기"라는 반발 섞인 반응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팹(생산설비)과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국가전략사업이다. 최대 투자 규모는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인허가가 완료됐고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삼성전자는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에 약 360조원을 투자해 팹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본격화한 토지 보상 절차는 이달 말 최대 50%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내년에 부지 조성공사에 나설 계획인데,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았다는 논리로 호남 이전론에 휘말리고 있다. 일반산단에 입주하는 SK하이닉스의 경우 공사가 상당 진행된 상태다.
"윤석열 계엄 끝내는 길"이 '용인 삼성전자 전북 이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론은 지난달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클러스터에서 쓰일 막대한 전기량을 용인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취지다. 김 장관은 "용인에 SK, 삼성전자가 쓸 전기량이 원전 15개 수준"이라며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 전기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했다.그러자 호남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북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앞세우며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올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구호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왔다. 같은 여당 내부에서까지 "정치적 주장"(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등 민주당 용인 지역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그런데도 호남 이전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앞서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는 주장을 폈던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26일에도 "용인 반도체가 전북으로 오기 위해서는 전북도, 도내 정치권, 시·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며 "새만금과 전북은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부지, 접근성이라는 산업 입지의 핵심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관련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 이중고에 "차라리 미국 가자"
시선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쏠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기업을 옮기라 마라 할 수는 없다"고 해 불붙은 호남 이전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하지만 곧 "균형 발전과 에너지 수급을 위해 정부가 설득하거나 유도할 수는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클러스터 이전을 압박하는 레토릭(수사)이 자꾸 나오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도 노골적인 대미 투자 압박도 받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과 대만을 겨냥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취지다.
설상가상 국내에서까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클러스터 이전론이 잠잠해지질 않자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차라리 미국으로 가자"는 극단적 반응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내부에서 난색을 표할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난색을 표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귀띔했다.
"반도체·나라 다 죽자는 얘기"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클러스터 이전론을 놓고 '이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부터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클러스터 이전론을 놓고 '이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부터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이전이라는 표현은 하던 걸 중단하고 옮기자는 말인데 지금 새로운 입지에 공장을 지으려면 7~8년, 길면 10년이 걸린다"며 "그 얘기는 10년 동안 공장을 짓지 말고 있자는 소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동안 공장을 안 지으면 10년 뒤에는 못 짓는다. 돈을 벌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니냐"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해야 투자 동력이 생긴다. 이전이 아니라 '확장'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표현은 반도체도, 국가도 다 죽자는 얘기다. 반도체 특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호남이 입지적으로 좋다면 나중에 검토해서 가면 된다. 하지만 최적인지 아닌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그 검토조차 몇 년이 걸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산단으로서의 정부와 민간 간의 '상호 신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전무는 "국가가 정하고 계획한 국가산단이 틀어진다면 국가와 산업 간의 신뢰 문제가 깨지는 것"이라며 "국가가 땅을 주겠다며 공장을 지으라고 한 사안에 대해 여러 지역에서 옮기라 마라 해서 흔들려선 안 된다. 국가가 지원해줘야 하는 인프라를 볼모로 입지를 정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