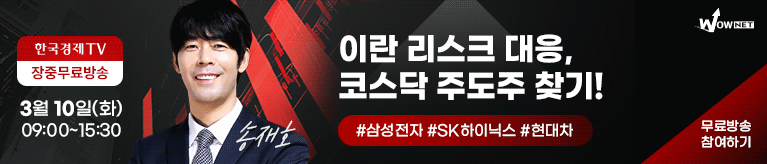경주(競走), 달리기를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 많다. 토끼와 거북이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은 교훈만큼이나 흔한 이야기다. 식상하지만, 늘 통한다. 부지런해라. 자만 하지 마라. 거북이도 교훈의 대상이지만, 토끼는 더 그렇다. 골치 아프게 교훈 이야기냐 생각하는 독자들께서는 참아 주시라. 코칭 이야기다. 더임코치의 컨피던스 코칭 핵심인 강점을 찾아 성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12간지, 즉 매 12년을 주기로 해마다 상징 동물이 있다. 이를테면 올해는 병오년 말띠 해다. 흔히 ‘올해가 무슨 띠?’라는 질문에 나오는 ‘띠’다. 12간지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다. 외우느라 애먹은 기억이 새롭다. 동물 순서로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순(順)이다. 옥황상제 컵 달리기 시합에 참여, 골인한 순서다. 대체로 동의 된다.
그런데, 쥐와 뱀은 어떻게 앞자리를 차지했을까? 독자들은 그 이유를 기억하실 거다. 그렇다. 그 뒤에 있는 동물들을 이용한 것이다. 쥐는 소 등에 올라타 편하게 왔다. 최종 지점을 앞두고 뛰어내려 1위로 골인했다. 뱀은 말 다리 사이에서 튀어나와 말보다 빨랐다.
12간지의 순서는 여러 의문을 품게 하지만, 각각의 이유를 만들어 놨다. 열두 동물 중에 유일하게 날 수 있었던 용(龍)은 다른 동물들을 돕느라 늦었다. 뱀보다는 앞서며 체면을 살렸다. 돼지는 먹고 자느라 늦었다. 그래서 12간지의 막내가 된 것이다.
달리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 경주와 관련한 동물은 단연코 말(馬, Horse)이다. 야생이던 말이 인간을 만나 팔자가 비참해졌다.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에 의해 길들여 졌다. 그렇게 말의 운명은 정해졌다. 어느 말은 전쟁터에서, 또 다른 말은 경마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달린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잘 못 달리는 말은 죽음을 면키 어렵다. 물론 짐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태우는 이동 수단인 말도 있다.
2026년 올해는 병오년 ‘말띠 해’다. 지난 연말부터 가장 많이 받은 신년 메시지 소재는 당연히 말이다. 독자들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래서 ‘말’ 얘기를 해 본다. 누가 물었다. 사람은 말과 달리기 시합을 하면 이길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모든 답은 ‘이길 수 없다’일 것이다. 아니면 이 질문의 의도를 몰라 ‘글쎄요!’ 정도의 답도 예상된다. 생각해 보시라. 위 두 가지 대답 말고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는지.
이 질문에 시대의 지성이던 이어령 선생이 한 말로 다른 답을 낸다. 말과의 경쟁에서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아주 간단하다. 12간지의 쥐나 뱀이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말에 올라타면 된다. 올라타고 달리다 파이널 지점에서 말을 멈추고 말 머리 앞쪽으로 뛰어내리면 먼저 골인한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하다. 이러고 보면 정답은 ‘반드시 이긴다’이다.
쥐나 뱀이 달리기를 해서 소, 호랑이, 말을 이길 확률은 없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길 가능성은 또 어떤가? 역시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진 동화 속에서 이 가능성은 무용지물이다. 쥐가 소를 앞섰고, 뱀은 말보다 먼저였다. 경우는 다르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앞질러 이겼다.
현실 세계로 와 보자. 삼성전자를 앞선 SK하이닉스는 어떤가? 누가 봐도 이건 성립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게 객관성이다. 그리고, 당사자인 삼성이나 SK 모두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년 뒤처지던 SK하이닉스가 백만 닉스를 바라볼 때 삼성은 십만 전자를 넘나들고 있다. 세상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것을 12간지로 대입해 보면 호랑이(寅)격 삼성전자를 소(丑)격인 SK하이닉스가 앞선 것과 같다. 소는 호랑이를 앞설 수 없다. 그런데 앞선 것이다.
세상 모든 이치에 이변은 있다. 그저 가정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변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코칭이 필요하다. 세상에 없는 일, 생길 수 없는 일, 생기면 이상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코칭이다.
그게 가능한 이유? 성선설에 답이 있다. 다시 말해 ‘스스로 돕는 자, 즉 스스로 구하는 자를 하늘이 돕기 때문이다. 스스로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다. 무위무사(無爲無事)다.
코칭 관점에서 이 이변은 당연한 결과다. 사람과 말의 달리기 시합에서 사람이 이긴 경우를 보자. 사람은 말과 달리기 시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고? 그게 상식이니까. 정답이다. 그러면 영원히 사람은 말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어령 선생의 표현을 빌려 그 답을 찾아본다. 누구도 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방법을 생각했다.
이것은 완벽한 전환이다. 사람은 말과 달리기 경쟁을 할 수 없다. 이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왜 사람이 말과 달리기 경쟁을? 말은 사람을 태우고 달리도록 길들여 놓았는데, 굳이 왜 말과 같이 달려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과의 달리기 경쟁은 아무것도 아니다. 경쟁의 요지는 골인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먼저 도착한 쪽이 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당연히 이긴다. 문제는 ‘경쟁’만 생각하지 ‘게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코칭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보면 답이 없다. 이럴 때 해야 하는 것은 문제를 분절(分節), 즉 미분하는 것이다. 쉬운 방법으로 전후좌우(前後左右)가 아니라 상하(上下)로 바꿔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시원한 동치미를 담고 있는 오백년 된 백자(白瓷) 사발을 보자. 위에서 보면 동치미만 들어온다. 백자의 기품은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옆에서, 그렇게 돌려 봐야 비로소 수십억 가치의 백자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가? 보는 눈높이, 관점만 바꾸면 된다. 이 과정과 결과가 코칭이다.
12간지 동화 속 동물들이 옥황상제 컵 달리기 시합에서 골인한 순서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동화가 설명하지 않는 순서가 있는데 바로 소와 호랑이다. 상기해 보면 자축인묘(子丑寅卯), 즉 쥐 - 소 ? 호랑이 - 토끼 순이다. 어떻게 소는 호랑이보다 앞서 왔을까? 그 무거운(?) 쥐를 등에 태우고 말이다.
이것은 반전이고, 이변이다. 앞서 얘기한 데로 SK하이닉스가 요지부동의 삼성전자를 앞선 것과 같다. 어떻게 이런 이변이 일어났는가? 호랑이와 소의 먹이사슬로 보면 초식인 소는 육식인 호랑이에게 최고의 먹잇감이다. 소는 시속 50km, 호랑이는 80km로 알려져 있다. 상식적으로 소가 호랑이를 앞서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코칭의 눈으로 보면 이렇다. 절박함이다. 비록 옥황상제 컵 달리기 대회라곤 하지만, 호랑이도 소도 본능(本能, Instinct)이 있다. 잡아먹어야 하는 본능, 잡히면 죽는다는 본능. 두 본능 간의 경쟁이다. 두 본능을 절박함 관점에서 보자. 어느 본능이 더 절박한가? 당연히 ‘잡히면 죽는다’는 본능이 ‘도망치지 못하면 죽는다’는 절박함을 부른다. 절박함 그 자체다. 소는 그렇게 달렸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약육강식의 상위 포식자인 호랑이를 시합에서 만난 소. 바로 ‘죽음’에 직면한 절박함이다. 소에게 솟아날 구멍은 ‘사력(死力)’, 즉 죽을힘을 다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궁즉통(窮卽通), 궁하면 통한다. 절박함이 솟아날 구멍을 찾은 것이다. 그렇게 소는 호랑이를 앞섰다. 12간지의 두 번째 서열이 된 것이다.
코칭은 12간지 중 가장 느릴 것 같은 쥐가 1위로 골인한 것, 사람이 말과 달리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소가 호랑이 보다 앞서는 것, 그리고 천하의 삼성전자를 앞선 SK하이닉스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관점을 전환하는 것, 절박함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코칭의 핵심이다.
더임코치의 컨피던스 코칭은 사람과 말이 달리기 경쟁을 해서 이기는 방법을 같이 찾는다. 또 호랑이에게 쫓겨 죽음에 처하게 된 소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도 같이 찾는다. 스스로 관점을 전환하고 절박함을 알게 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임코치의 컨피던스 코칭은 관점의 전환이고, 궁즉통이고, 솟아날 구멍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더임코치/수길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