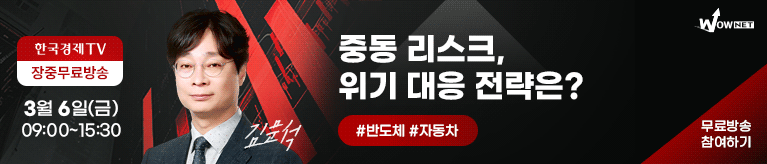로봇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간단하다. 차가움, 냉철함, 이성, 무감정, 단단함… 이러한 특성의 로봇에게 '사랑'은 상당히 부조화한 단어처럼 보인다. 인간에게도 가장 고차원적인 감정으로 꼽히는 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학습해 사랑까지 깨닫고,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감상을 얻게 될까.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이 궁금증의 답을 향해 묵묵히, 그리고 꼼꼼하게 걸어 나가는 작품이다. 공연장을 나갈 때면 따뜻함, 소중함, 사랑, 소통, 그리움 등의 단어가 머릿속을 맴돈다. 미국 브로드웨이를 휩쓸고 돌아온 '역설의 미학'이 올겨울 또 한 번 한국 관객들의 마음의 온도를 높였다.
21세기 후반 서울. 한 낡은 아파트에는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 '헬퍼봇'들이 모여 살았다. 올리버는 집 밖에 나가는 일이 없었다. 정해진 패턴대로 늘 똑같은 하루를 사는 헬퍼봇이었다. 그가 만나는 사람은 잡지를 배달하는 집배원이 유일했다. 반면 클레어는 적극적이었고, 당돌했다. 혼자보다는 여럿과 어울리는 게 좋았다.
어느 날 누군가가 올리버의 집 문을 두드렸다. 집배원이 올 시간이 아니었던 지라 올리버는 당황했다. 문을 두드린 건 충전기가 고장 나 도움을 요청하려던 클레어였다.
'똑똑'
그렇게 올리버의 삶에 클레어가 들어왔다.


올리버와 클레어의 공통점은 주인들로부터 버려져 은퇴한 헬퍼봇이었다는 것 단 하나였다.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인간으로 치면 올리버는 I(내향형), J(계획형) 성향이었고, 클레어는 E(외향형), P(즉흥형) 성격이었다. 그런 둘의 의견이 모인 건 제주도로 떠나자는 것. 올리버는 이전 주인에게 돌아가기 위해, 클레어는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 차에 올랐다.
인간 세계로 나가기 위해 둘은 커플로 분했다. 마치 사람인 것처럼.
사람의 감정을 글로써 숙지하고 있던 이들이 유일하게 이해하지 못한 게 바로 사랑이었는데, 긴 여정 속에서 올리버와 클레어는 마침내 사랑의 감정까지 닿게 된다. 사랑은 즐겁고 행복했고, 티격태격했고, 또 아팠다. 낡아가는 몸처럼 이들은 여정의 끝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
결말에 다다를 때면 객석은 이내 울음바다가 된다. 0%에 수렴했던 사랑을 100%까지 학습하는 로봇들의 관계에서 아주 순수하고 직관적인 감정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이토록 인간적인 감정에 깊이 빠져볼 일이 있을까.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로봇의 시점으로 본 인간의 사랑은 위대했다. 잊고 있던 소중한 감성이 마음 안에서 고개를 든다.

소박하게 전개되는 극의 분위기는 감성을 더욱 극대화한다. 피아노와 두 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드럼으로 구성된 6인조 라이브 챔버 오케스트라가 완성도 높은 넘버를 부드럽게 귀에 전달한다. 종이컵 전화기, 화분, LP 등 아날로그 소재들은 시대 배경과 대조를 이루며 관객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또 한 번 건드린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지난해 공연계 최고 권위의 미국 토니 어워즈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무려 6관왕을 달성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위상을 드높였다. 작품은 한국인 박천휴 작가와 미국인 윌 애런슨이 공동 창작했다.
특히 이번 10주년 공연에는 초연 무대를 이끌었던 전미도, 최수진, 김재범, 고훈정이 함께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공연하며, 이후에는 부산, 대전, 광주에서 투어를 이어간다. 매진 행렬이 이어지며 작품을 향한 관심과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