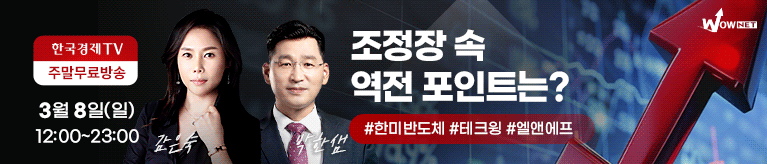“과거엔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 간) 빅딜 소식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런 게 없다 보니 그냥 일반 기업 행사 같았습니다.”
“과거엔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 간) 빅딜 소식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런 게 없다 보니 그냥 일반 기업 행사 같았습니다.”지난 12~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간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 2026)에서 만난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의 말이다. JPMHC는 세계 최대 규모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로 꼽힌다. 올해는 그 명성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게 서 대표를 비롯한 참가자 다수의 평가다.
굵직한 인수합병(M&A)이나 대형 기술 이전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행사 첫날부터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이 20조원을 들여 조현병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텍 인트라셀룰러테라퓨틱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애브비가 중국 바이오텍 리메젠과 맺은 8조원대 기술 이전 계약이 최대 규모였다. 글로벌 제약사의 바이오텍 인수 소식은 아예 없었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거대 제약사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업 발표에서도 글로벌 제약사의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덴마크 노보노디스크는 더 이상 무분별한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아스텔라스도 “대규모 M&A를 통해 기업 규모를 늘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변화는 한국 바이오 기업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다수 바이오텍은 전임상이나 임상 초기 단계에서 기술을 이전해 매출을 일으켰다. 비슷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의 기업 인수 제안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사들이 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더 이상 비슷한 전략으로 생존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 기업도 더 이상 단기 기술이전 성과나 피인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 나온 신약 물질을 후기 임상, 궁극적으로는 상업화까지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신약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책임지는 ‘한국형 빅파마’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은 반갑다. 김경아 삼성에피스홀딩스 사장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단기간의 성과나 단순 파이프라인 확대는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제를 기업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글로벌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장기간 연구개발(R&D)과 대규모 투자금 유치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앞장서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위기를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