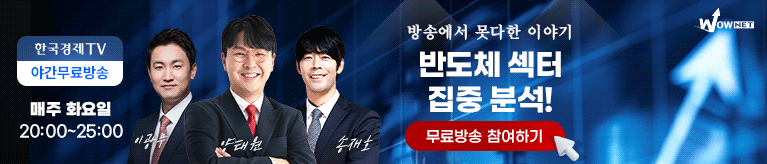“‘기후 위험이 있습니다’가 아닌, ‘그 위험의 가격표가 얼마입니까’를 물어야 한다.”
전 영국중앙은행 총재이자 현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의 이 말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다. 2022년 태풍 힌남노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강타했을 때, 기후 위기는 명확한 숫자로 모습을 드러냈다. 단 한 번의 기상 재난으로 생산라인이 멈췄고, 복구 비용만 2조 원이 들었다. 기후 위기가 과학자의 예측을 넘어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현실 속 위협’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과연 우리 기업은 그 가격표를 읽고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기후 공시, 선택 아닌 글로벌 의무
글로벌 기후 공시의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해 기후 관련 공시기준(S2)을 발표하며 기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체계를 글로벌 회계 기준으로 격상시켰다. 나아가, 2023년 최종 권고안에서는 기후변화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손실까지 재무 리스크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홍콩은 2026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스코프 1·2(직간접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했고, 일본은 2027년부터 프라임시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ISSB 기준 공시를 법제화했다.
반면, 한국 금융위원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이후 구체적 로드맵 시점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이 제출한 보고서도 대부분 ‘자율공시’에 그치며, 국제기준은 물론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준비 격차마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225개 기업 중 95%가 “기후변화 위험을 식별했다”고 답했다. 기후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 위험이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 숫자로 제시한 기업은 17%에 불과하며, 수치 산출 근거를 밝힌 기업은 9%에 그쳤다. 95%의 기업이 위험을 ‘안다’고 답했지만, 이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답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중 1곳도 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기업이 직면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ESG를 위한 기후 문해력 갖추려면
기업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의 고민은 비슷하다. “남들 다 하는 ESG 말고, 우리 회사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ESG를 왜(why) 해야 하는지는 이해하지만, 어떻게(how) 해야 할지는 막막하다는 것이다.
해답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조직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환경을 고려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ESG가 특정 부서의 과제로 국한되고, 부서 간 이해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기후 문해력(climate literacy)’이다.
기후 리스크는 내 업무의 성패를 결정하는 ‘나의 일’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 선택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더 지속가능한 대안은 없는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을 고려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이 일상이 될 때 기후 리스크를 줄이는 역량이 만들어진다. 전 직원이 기후 위기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자기다운 ESG’의 근간이다.
기업의 환경교육, 미래의 재무제표 결정한다
기후 문해력은 현재 임직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업이 미래세대 환경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들은 기업의 ‘미래 인재’이기 때문이다. 기후 문해력을 갖춘 세대는 모든 의사결정의 기본값에 환경을 반영하는 ‘기후 네이티브’로 성장하며, 이는 기업의 독보적 장기 경쟁력이 된다.
둘째, 이들은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미래 고객’ 이다. 기후 위기의 가격표를 읽을 줄 아는 소비자는 기업의 겉치레가 아닌 진정성을 읽어내고 구분해낸다.
결국 미래세대 환경교육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기업의 미래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본질적인 ‘재무적 투자’다. 현재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은 10년 뒤 기업의 재무제표를 방어할 가장 강력한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 위험 분석 플랫폼’은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인공지능(AI)이 제공하는 정교한 숫자를 기업의 산업 맥락에서 해석하고, 실질적 대응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점이다.
데이터는 방향을 제시할 뿐, 그 방향으로 배를 움직이는 것은 교육받은 구성원들의 판단과 역량이다. 도구가 있어도 그것을 다룰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 조직 내부에 탄탄히 뿌리내린 기후 문해력이야말로 거세지는 공시의 파도를 넘는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자, 남을 따라 하는 ESG가 아닌 우리만의 가치를 세우는 ‘자기다운 ESG’의 출발점이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