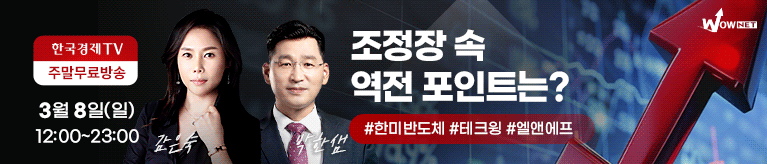"재판은 법으로 하는 쇼", "피해자는 손님일 뿐, 재판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법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그들끼리 벌이는 게임"…. 법원 앞 시위 현수막에서 볼 법한 문구들이다. 부장판사 출신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 변호사는 신작 장편소설 <4의 재판> 속 등장인물들의 입을 빌려 이처럼 법정을 향한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도 변호사는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 민사재판을 보고 '이건 잘못됐다. 나라도 한마디 해야겠다'는 마음에 <4의 재판>을 쓰기 시작했다"며 "법 원칙에 어긋난 판결은 예비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거나 추가 범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변호사이자 소설가로 활동 중이다.
2014년 <유다의 별>로 한국추리문학대상을 수상하는 등 추리소설을 왕성하게 집필해온 그가 이번에는 본격 법정소설을 선보였다. 소설은 '법정' 그 자체가 주인공이라고 할 만큼 현재 사법부를 직격한다. 도 변호사가 "이번 소설은 판사들이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까닭이다.

<4의 재판>은 결혼을 앞둔 '지훈'이 20년 지기 '양길'과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떠났다가 갑자기 사망하며 시작한다. 지훈의 약혼녀 '선재'는 양길을 의심한다. 검사 역시 지훈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의 유일한 수익자가 양길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양길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범죄 사실 입증에 난항을 겪는다. 법원이 진실을 밝혀줄 거라 기대했던 선재는 재판이 거듭될수록 정의 실현보다는 사회의 유지, 즉 질서에 더 관심 있는 사법 시스템, 판사의 확증편향을 바로잡을 장치가 없는 현실에 절망한다. 소설에서 '선재'는 이렇게 따져 묻는다. "법을 작동하는 사람이 때때로 실수를 하는 것 같아. (…)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지만 비판조차 하면 안 되는 성역은 아니지 않아?"
작품의 모티프가 된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2014년 교통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95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진 민사재판에서도 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줘 보험금은 남편에게 전달됐다.

도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라고 해서 범죄 혐의가 다분한 사람에게 민사재판을 통해 보험금 같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도록 재판부가 '살인 하이웨이'를 깔아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법리보다 관행, 조직 내 눈치 보기 같은 이유가 형사 판결과 민사 판결의 결론을 일치시키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봤다.
그는 "해당 민사재판은 '법리에 맞추느라 정의에 반했다' 수준이 아니라 법 원칙조차 어긋난 판결"이라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모든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을 원칙으로 삼는 형사재판과 달리 '증거의 우월'을 기준으로 삼는 민사재판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기각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도 잘못하면 소송을 당하는데 사법부는 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전문가 집단"이라며 "비판의 성역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애정을 담은 '선배의 쓴소리'다. 도 변호사는 "조직을 나와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며 "소설에 언급한 '피해자 유족의 기록 접근권' 같은 건 사실 현직에 있을 때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주제의식이 강한 소설이지만 몰입감과 재미를 놓치지 않았다. 작품을 다 읽고 나면 독자는 왜 이 소설의 제목이 '4의 재판'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도 변호사는 '작가의 말'에 이렇게 썼다. "소림사는 불공이 2순위이고 무술이 1순위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제게도 어디까지나 주제는 2순위이고, 재미가 1순위입니다."
웹소설, SF 추리소설 등 다양한 도전을 즐겼던 도 변호사는 최근 '법정에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것을 써보려고 한다"며 "감탄을 자아내는 트릭을 뽐내는 추리소설보다는 인간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는 소설을 써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