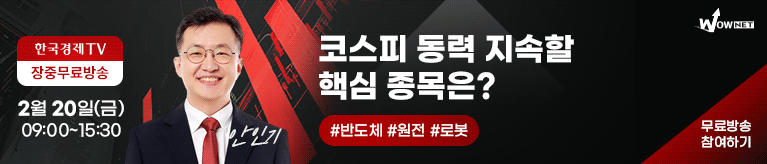의과대학 교과서에는 암을 알릴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이 적혀 있다. 조용한 공간에서,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천천히, 차분히 설명하라고 돼 있다. 하지만 진료실의 현실은 이런 규칙을 따르기 어렵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호자가 다급하게 묻는다. “선생님, 암인가요?”
의과대학 교과서에는 암을 알릴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이 적혀 있다. 조용한 공간에서,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천천히, 차분히 설명하라고 돼 있다. 하지만 진료실의 현실은 이런 규칙을 따르기 어렵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호자가 다급하게 묻는다. “선생님, 암인가요?”환자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긴장한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럴 때 나는 매뉴얼보다 먼저 환자의 얼굴을 본다. 말의 속도를 늦추고, 문장을 고르며, 한 번에 다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암을 마주하는 일은 환자에게만 힘든 게 아니다.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의사도 매번 낯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처음 암을 알릴 때보다 더 어려운 순간이 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치고 “이제 관리를 잘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외래에서 경과를 지켜보던 중 재발 및 전이를 알려야 할 때다. 그 순간이 더 무거운 이유는 정보 무게보다 관계의 무게 때문이다. “이제 조금 숨 돌리셔도 됩니다”라고 안심시킨 환자에게 다시 숨 막히는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같은 시간을 건너왔다. 힘든 치료 과정을 함께 견뎠고, 조심스러운 기대도 함께 품었다. 그래서 재발이나 전이라는 말은 단순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 함께 지나온 시간을 뒤흔드는 말이 된다.
그리고 가장 말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다. 더 이상 마땅한 치료법이 남아 있지 않을 때다. “현재로선 암을 줄일 수 있는 치료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환자가 묻는다. “호스피스에 가야 하나요?” 옆에 있던 보호자도 묻는다. “신약이나 새로운 임상시험은 없나요?”
그 말들에는 원망과 애원이 함께 묻어 있다. 나는 그 질문들 앞에서 잠시 말을 잃는다. 지금껏 써오던 의학적 언어들이 그 순간만큼은 좀처럼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3분 진료’라고 불리는 짧은 시간 동안 복잡한 영상 검사 결과, 다른 진료과의 기록, 약 처방까지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진행된 암을 진료하는 대부분의 의사는 진료 하루 전날 결과를 미리 검토하고 차트에 기록해 둔다.
차트를 들여다보면 환자와 보호자의 얼굴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조직 검사에서 암이 확인되거나 영상 검사에서 재발이 의심되면 그 결과는 자동으로 주치의에게 전달된다. 그중 암이 나빠진 환자가 보이면 그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된다.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덜 무겁게 들릴까, 어디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경험이 쌓일수록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일에는 익숙해진다. 하지만 암을 알리는 일, 재발과 전이를 말하는 일,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건네는 일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내일 진료 준비를 위해 차트를 연다.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말들을 내일은 어떻게 건네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