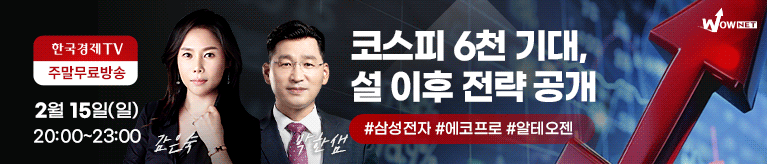올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인수합병(M&A) 거래액이 급증했다. 특히 ‘메가 딜’은 두 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연이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빅파마들이 생존을 위한 인수전에 나서면서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인수합병(M&A) 거래액이 급증했다. 특히 ‘메가 딜’은 두 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연이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빅파마들이 생존을 위한 인수전에 나서면서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8일(현지시간)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M&A 총 거래액은 전년 대비 31.0% 늘어난 1796억달러(약 257조8000억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4분기 총 거래액은 675억달러로 2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M&A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인 75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오 M&A가 대규모 거래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다.
실제 올해 들어 ‘조 단위’ 거래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MSD의 베로나파마 인수(100억달러), 화이자의 멧세라 인수(100억달러), 노바티스의 애비디티바이오사이언스 인수(120억달러) 등 100억달러 이상의 메가 딜이 잇따랐다. 특히 사노피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블루프린트메디슨(95억달러), 바이스바이오(15억달러), 다이나백스테크놀로지스(22억달러) 등 총 18조9000억원 규모의 M&A를 체결하며 시장을 이끌었다.
바이오 M&A가 메가 딜 중심으로 재편된 배경엔 ‘특허 절벽’이 있다. 2030년까지 오젬픽(노보노디스크·2026년), 키트루다(MSD·2028년), 옵디보(BMS·2028년), 듀피젠트(사노피·2030년) 등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특허가 줄지어 만료된다. 시장에서는 특허 절벽에 따른 매출 공백이 2030년까지 1800억달러(약 25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빅파마들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증된 신약’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 인수에 대거 나섰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뚜렷해진 금리 인하 기조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커진 현금 동원력은 자양분이 됐다. 컨설팅업체 언스트앤드영(EY)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빅파마의 자금 동원력은 1조3000억달러(약 1864조원)에 달한다.
달라진 건 M&A 규모 뿐만이 아니다.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플랫폼’ 인수보다는 임상 2·3상을 통과해 1~2년 내 즉각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후기 임상 자산’ 확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인수 전략도 바뀌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빅파마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검증된 자산을 집중 매입하는 ‘진주 목걸이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오 M&A 시장이 커진 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국내 기업은 미국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M&A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GSK 공장 인수(2억8000만달러), 셀트리온의 미국 뉴저지주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3억3000만달러)가 대표적이다. 삼일PwC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는 파이프라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정 자산 중심의 거래가 주를 이뤘다”며 “내년 M&A도 거래 건수 확대보다는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차별성을 갖춘 혁신 자산 확보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