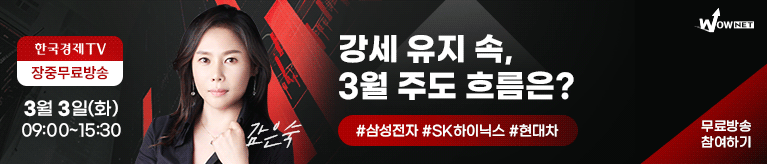중국 경제가 '완만한 둔화' 단계를 넘어 '구조적 디플레이션'의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순환의 일시적 하락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적 요인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디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장기침체'와 '과잉생산'입니다.
중국의 중산층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장기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가계의 부(富)가 줄었습니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가계는 소비 대신 부채 상환과 저축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은 자산 디플레의 그림자가 소비 위축으로 번지고, 소비 부진은 다시 산업 전반에 냉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중국 대도시 상하이나 베이징의 고급 식당가에서는 변화가 뚜렷합니다. 예전엔 예약이 어려웠던 고급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거나, 중저가 메뉴로 교체하거나 폐업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급식당의 몰락은 정부의 '공적 접대 제한' 조치도 한몫했지만, 본질은 소비 둔화입니다. "고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장 상인들의 푸념은 디플레이션의 실상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년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인 총수요 결핍이 만들어낸 디플레이션의 그림자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 성장 모델의 한계
중국의 성장 엔진은 오랜 기간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 대량생산 → 덤핑 수출'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이 모델은 중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하며 세계의 공장을 만들었지만, 미·중 갈등,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재편이 겹치면서 더 이상 그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중국의 과잉생산은 지금 산업 곳곳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은 단순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수요가 줄어든 현실의 반영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출혈적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서고, 정부는 이 같은 과당경쟁을 단속하지만, 실효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치는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좀비기업과 공급 과잉의 정치 경제
중앙정부는 오래전부터 낙후 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부실기업이지만 고용, 세수, 정치적 안정이 그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정리는 늘 뒤로 밀립니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으로 성장률 저하 그리고 실업 사태가 터질까 두려운 것입니다.이런 기업들은 이윤은 없지만, 고용과 지방 국내총생산(GDP) 통계 그리고 공직자의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연명은 과잉 생산과 부채 누적을 심화시킵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책으로 소비 쿠폰이나 보조금을 뿌려도, 국민들은 미래가 불안하여 여전히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과잉생산과 내수 침체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중국 기업들은 덤핑 수출을 택한 듯 보입니다. 철강,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같은 주력 산업에서까지 덤핑에 가까운 수출이 늘면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까지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플레이션 수출'입니다.
한국 산업에 미치는 압박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한국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한국의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즉각 위축됩니다. 중국과 가격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합니다.한국은 중국발 덤핑 리스크를 흡수하기 위해 일본·미국·유럽·동남아 등지로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단순한 부품·중간재 산업에서 벗어나 기술·브랜드·혁신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는 현안 타개를 위해 중국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거는 공격 경영을 추천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4%대 후반의 성장을 지속하는 만큼,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양신(兩新)', '양중(兩重)' 같은 교체·신산업·신 인프라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은 추진해 봄 직합니다.
중국의 구조적 디플레이션은 위기지만, 동시에 우리 산업 체질을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 흐름을 리스크가 아닌 전략적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평규 경영학박사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