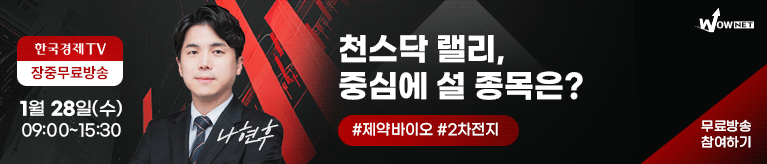영국이 유럽 대륙과 좁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섬나라’가 된 것은 빙하기 말 지형 변화의 결과였다. 이 지리적 조건은 영국이 대륙과 거리를 둘 것인지, 아니면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하게 했다.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로 거대사 서술의 기준을 새로 세운 역사학자 이언 모리스는 신작 <지리는 운명이다>에서 영국 현대 정치를 휘감은 분열의 뿌리를 1만 년의 지리·고고학적 조건 속에서 읽어낸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역시 ‘갑작스러운 정치적 사고’가 아니라 섬의 고립성과 대륙 접근성 사이에서 되풀이된 장기적 갈등의 반복이라는 것이 그의 핵심 진단이다.
영국이 유럽 대륙과 좁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섬나라’가 된 것은 빙하기 말 지형 변화의 결과였다. 이 지리적 조건은 영국이 대륙과 거리를 둘 것인지, 아니면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하게 했다.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로 거대사 서술의 기준을 새로 세운 역사학자 이언 모리스는 신작 <지리는 운명이다>에서 영국 현대 정치를 휘감은 분열의 뿌리를 1만 년의 지리·고고학적 조건 속에서 읽어낸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역시 ‘갑작스러운 정치적 사고’가 아니라 섬의 고립성과 대륙 접근성 사이에서 되풀이된 장기적 갈등의 반복이라는 것이 그의 핵심 진단이다.저자는 영국이라는 섬을 이해하기 위해 세 장의 지도를 불러낸다. 먼저 기원전 6000년부터 1497년까지 7500년 동안의 세계관을 담은 ‘헤리퍼드 지도’는 영국을 유럽 변방의 끝자락에 뒀다. 이 시기 유물들을 보면 농경·금속·종교·정부 조직 등 문명적 변혁이 가장 늦게 도달하던 곳이 바로 영국이었다. 바이킹의 침입, 로마가톨릭의 유입, 로마 제국의 흥망은 무덤과 동전, 저택의 양식을 바꾸며 영국을 ‘유럽의 일부’로 붙들었다. 바다는 여전히 장벽이었다.
 그러나 1497년 이후 해양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자 지리는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이른바 ‘매킨더 지도’. 대항해 시대의 세계상에서 영국은 장벽이던 바다를 고속도로로 바꾸는 데 가장 능숙한 국가였다. 강력한 해군력과 조직 혁신을 결합해 영국은 북미 호주 중동 아시아로 뻗는 제국을 세웠고, 가난한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영국엔 화려한 건축물이 세워지고, 시골 마을 유적에서도 영국 정체성의 상징인 찻주전자와 찻잔이 발견될 정도로 소비문화가 확산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시대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막을 내렸다.
그러나 1497년 이후 해양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자 지리는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이른바 ‘매킨더 지도’. 대항해 시대의 세계상에서 영국은 장벽이던 바다를 고속도로로 바꾸는 데 가장 능숙한 국가였다. 강력한 해군력과 조직 혁신을 결합해 영국은 북미 호주 중동 아시아로 뻗는 제국을 세웠고, 가난한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영국엔 화려한 건축물이 세워지고, 시골 마을 유적에서도 영국 정체성의 상징인 찻주전자와 찻잔이 발견될 정도로 소비문화가 확산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시대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막을 내렸다.전후부터 2103년까지를 설명하는 세 번째 지도는 ‘부의 지도’다. 전신, 석유 엔진, 제트기, 위성, 인터넷이 지구를 하나의 시장으로 엮으며 바다는 더 이상 방벽이 되지 못했다. 정보와 미사일은 거리 개념을 무력화했고, 세계의 중심축은 대서양에서 동아시아로 기울기 시작했다. 영국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사이에서 자리 잡기를 고민해야 하는 주변국으로 밀려났다. 모리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브렉시트를 읽는다. 많은 영국인이 ‘제국의 시대’를 기본값처럼 기억한 채 선택을 내렸고, 세계 질서가 이미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지리가 인간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단선적 결정론을 경계한다. 오히려 인간이 만든 조직과 기술이 지리의 활약 무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며, 인간은 그 변화에 반응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거나 놓쳐왔다고 말한다. 이런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은 고고학 자료와 기록 문헌이다. 저택 크기, 무덤 양식, 건축 붐 같은 구체적 증거가 영국사와 세계사의 장기 흐름을 촘촘히 연결한다.
책의 마지막은 다시 ‘거대사의 망원경을 반대로 돌려’ 영국 중부 도시 스토크온트렌트로 향한다. 주민의 70%가 브렉시트 찬성표를 던진 곳이자 모리스의 고향이다. 저자는 수십 년 만에 고향을 걸으며 주민의 대화를 엿듣는다. 그들의 화제는 유럽연합도, 금융위기도, 세계화도 아니다. 잃어버린 열쇠, 아이의 기침, 중고차 이야기로 채워진 일상이다. 그 뒤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새겨진 작은 도자기 잔이 세계 질서의 움직임을 은연중에 증언한다. 책은 브렉시트라는 단일 사건을 넘어서 세계화 시대의 국가 정체성과 선택을 다루고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