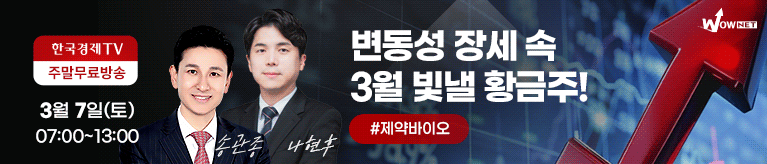작년 이맘때쯤이었다. 한 설렁탕집 앞에서 호출이 울렸다. 식당 불을 끄고 나온 중년 여성 두 분이 택시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진한 고깃국물 냄새가 차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백미러로 힐끔 본 두 분의 얼굴에는 ‘피곤’이라는 두 글자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적막을 깨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늦게까지 고생하셨네요. 퇴근하시나 봅니다.” “네, 늘 이 시간이죠. 버스 타고 집에 가기엔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 택시를 타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다. 한 설렁탕집 앞에서 호출이 울렸다. 식당 불을 끄고 나온 중년 여성 두 분이 택시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진한 고깃국물 냄새가 차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백미러로 힐끔 본 두 분의 얼굴에는 ‘피곤’이라는 두 글자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적막을 깨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늦게까지 고생하셨네요. 퇴근하시나 봅니다.” “네, 늘 이 시간이죠. 버스 타고 집에 가기엔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 택시를 타요.”알고 보니 그들은 퇴근만 늦은 게 아니었다. 집에 가서 씻고 눈만 붙였다가 새벽 5시 반이면 다시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재료를 준비하고 국물을 끓여 아침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엔 버스가 없잖아요. 우리는 택시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마그네틱이 닳고 닳은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골목길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깊은 응원을 보냈다. 그들에게 택시는 사치스러운 ‘이동 수단’이 아니라 치열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발’이었다.
택시 운전대를 잡다 보면 이처럼 절박한 순간을 자주 마주한다. 특히 기상이 악화하는 날, 플랫폼 택시의 연결 기술은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기도 한다. 지난 11월 때 이른 첫눈이 내리던 날, 갑작스러운 추위에 일곱 살 딸과 엄마가 20분 넘게 떨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누른 우버 앱 호출이 내 차에 잡혔다. 따뜻한 뒷좌석에 앉아 꽁꽁 언 손을 녹이며 안도하던 모녀. 아이의 빨개진 볼이 제 색을 찾을 때까지 택시는 따뜻한 피난처가 돼 줬다.
폭설이 내리던 또 다른 날의 기억도 선명하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집으로 가야 하는 휠체어 탄 어르신이었다. 눈길에 휠체어 바퀴는 헛돌고, 짧은 거리라 그런지 일반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결국 행인이 대신 불러준 우버 택시를 통해 나와 연결됐다. 눈을 맞으며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실었다가 목적지에서 다시 펴 드리는 과정은 고됐지만, 어르신의 진심 어린 감사 말씀에 운전대를 잡은 보람이 묵직하게 차올랐다.
이처럼 우버 택시와 같은 택시 호출 서비스는 대중교통이 멈춘 시간과 닿지 않는 공간을 연결하는 ‘도시의 모세혈관’이다. 새벽을 여는 노동자에게, 추위에 떠는 아이에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택시는 생활 필수재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웃이 많다. 특히 승차난이 심화하는 연말에는 이들의 고충이 가중된다. 교통 취약 계층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술과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연말에 “승차난이 심한 시간인데, 우버 택시 덕분에 편하고 빠르게 이동했다”며 칭찬을 건네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 기술과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올겨울 누군가의 귀갓길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