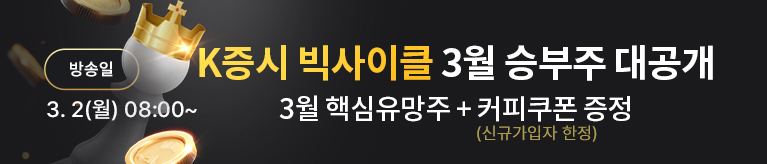서울의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시내버스와 달리 민간이 운영한다. 수익과 비용을 운수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울시가 개별 업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유령 버스를 동원한 보조금 빼먹기가 일상이 된 배경이다. 기사들의 근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서울시는 하루 평균 2.2명의 기사를 투입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계산하는데, 실제 몇 명의 기사가 일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조합은 내년부터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에서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를 강하게 압박해 지원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합은 마을버스가 환승 체계에 편입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서울시가 100%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금액이 연평균 1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서울시 지원액(412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이용자가 적은 적자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원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 조합은 경영난을 호소하기에 앞서 ‘사금고 경영’부터 일신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도 잘못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파업만 막자’는 안일한 자세로 임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