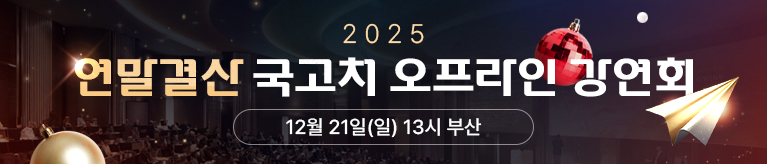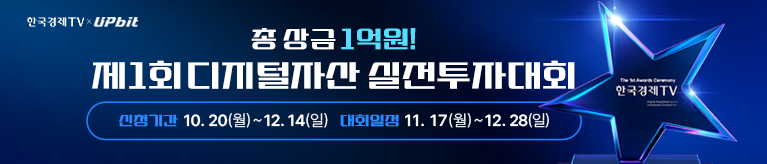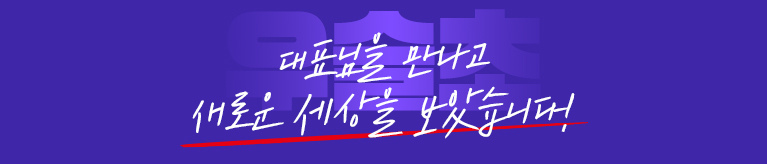19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1층에 있는 촬영 스튜디오. 화보 촬영이 한창이었지만, 현장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대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카메라 로봇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옷을 입은 마네킹을 찍고 있었다.
AI가 옷의 패턴, 재질, 실루엣을 자동 분석해 전신 및 디테일샷을 알아서 찍는다. 여기에 AI로 생성한 가상 모델의 얼굴을 합성해 다양한 포즈의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한다. 검색엔진에 잘 걸릴 만한 마케팅 문구를 생성하고, 제품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모두 AI의 몫이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6’가 이달 초 발표한 최고혁신상 수상기업인 국내 패션AI업체 ‘스튜디오랩’의 서비스 ‘젠시’다. 이 모든 과정에 드는 비용은 1만원대. 과거엔 전문 포토그래퍼, 모델, 마케터,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 달라붙어 일주일은 족히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이제는 점심 한끼 비용으로 단 몇 분만에 끝나는 일이 됐다.
○디자인도, 화보촬영도 AI로

생성형 AI가 패션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AI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산업은 거의 없지만, 그 중에서도 패션은 AI로 인한 변화가 거세다. 누구보다 빠르게 유행을 포착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게 업의 본질인데,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읽고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AI의 강점과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이다. 매 시즌별로 쏟아지는 다양한 컬러, 사이즈, 핏의 제품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패션 AI 생태계는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CES도 이같은 이유로 올해 혁신상 분야에 ‘패션’ 부문을 신설했다.
AI가 전방위적으로 침투하면서 패션업계에선 대표적으로 3가지가 사라지고 있다. 먼저 시제품이다. 나이키, H&M, 쉬인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AI를 활용해 SNS 트렌드와 소비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잘 팔릴 만한 디자인’을 정확하게 골라내고,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3차원(3D) 가상 샘플을 만든다. 실제 테스트 의류를 생산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3D 가상 샘플 이미지로 수요를 확인한 뒤 실제 생산에 돌입한다.
이렇게 하면 ‘기획 미스’로 인해 떠안게 되는 재고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트렌드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면서 유행 변화에 민감한 ‘패스트패션’ 업체들이 AI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자라는 AI 도입 후 초과재고를 20%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도 ‘조용한 AI’로 전환

모델도 없어지고 있다. 과거엔 모델이 일일이 옷을 입고 촬영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속모델의 얼굴 이미지를 한 번만 따놓으면 다양한 옷과 포즈의 이미지를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다. 아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모델도 점차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8월 게스는 미국판 보그에 처음으로 AI 가상 모델 광고를 실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마케터도 마찬가지다. 상품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검색엔진에 최적화(SEO)된 마케팅 문구를 도출하는 게 목표인데, 이 역할을 생성형 AI가 대체하고 있다.
장인정신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AI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명품 브랜드도 ‘조용한 AI(Quiet AI)’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세계 최대 명품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는 자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업과의 협업을 늘리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 익명 방문객의 클릭·스크롤 패턴과 접속 지역 등을 분석해 취향을 파악하고, 상품을 추천해주는 AI 기업 ‘카후나’와의 협업을 발표했다.
하성호 와이유파트너스 대표는 “럭셔리는 ‘개인화’가 생명인데, LVMH가 AI를 통해 익명 고객에게도 VIP와 같은 세심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AI 기술을 활용해 감성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이선아/이소이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