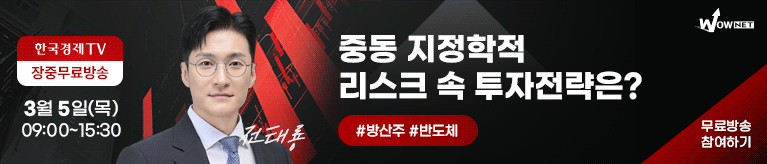중학생 아들이 입양 사실을 알고 "친부모에게 돌아가고 싶다"며 파양을 요구하자 16년 동안 그를 키워온 부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랑으로 품었던 아이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품에 안아야 할지 갈등하는 이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52)는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16년 전 한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양자 제도는 일반 입양과 달리 자녀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것으로 바꾸고,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입양 후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A씨는 "법원에 일반 양자가 아닌 친양자로 입양해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고, 친부모도 동의해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됐다"고 했다. 그렇게 가족이 된 이후 아들은 두 사람의 전부였다.
하지만 아들이 열여섯 살이 되던 봄, 우연히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들은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찾았다. 그 뒤로 식탁에서는 말이 줄고, 생일날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들은 결국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아들의 친부모도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한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형편이 많이 나아졌고, 그동안 아이를 한시도 잊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온 마음으로 키운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놓아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하던 순간, 자기 이름을 처음 썼던 날을 잊지 못한다"며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아이가 친양자이기 때문에 친부모에게 돌아가려면 법원에 친양자 파양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과연 아이를 위한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고 양부모의 친자녀로 인정된다"며 "그만큼 파양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자녀의 중대한 패륜 행위처럼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원이 파양을 허가한다"며 "단순히 양측이 합의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엔 예외적으로 파양이 인정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가 일시적 감정에 휩쓸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친부모에게 돌아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된다. 법원이 파양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친양자 파양이 허가되면 처음부터 입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양부모와의 친권, 상속권, 부양 의무가 모두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삭제된다.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자동으로 부활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A씨 부부는 좀 더 오랜 기간을 두고 아이의 마음을 지켜보며, 친부모와도 충분히 대화해 보길 권한다"며 "사랑해서 품에 안았던 만큼, 지금의 결정도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 길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