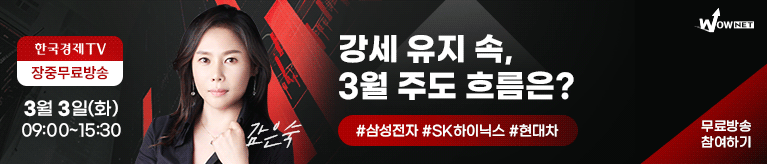채 여사는 지난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래돼 누렇게 뜬 일기장과 가계부를 박물관에 기증하게 된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막상 본인은 담담했는데, 자녀들이 신기해하며 ‘우리 엄마, 새삼 다시 보게 됐다’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채 여사는 1953년 성의고등학교에 진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일기를 쓰게 됐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교장을 지낸 학교다. 당시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해 여성이 진학하는 게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채 여사도 지금 기준으로는 졸업했을 나이에 고등학생이 됐다. 소소한 일상을 담아 일기를 쓰던 습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채 여사는 “일기는 나와의 대화”라고 했다. 1958년 결혼한 뒤에는 5남매를 키우는 가정주부로 살았다. 십 원 한장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가계부를 열심히 쓰게 됐다고 했다.
채 여사의 일기와 가계부 내용은 소박해 보일 수 있다. 오늘은 무엇을 먹었다, 누구를 만났다, 어디를 갔다 등 간단한 일상에서부터 출산·육아와 신문에 기고한 경험처럼 일생일대의 경험, 역사적 사건 앞에서의 느낌 등이 일기에 기록됐다.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려는 주부의 고군분투는 가계부의 숫자로 남았다. 이 중 59점을 박물관에 기증했다. 채 여사 또래 여성의 문맹률이 높았던 시절이라 여성이 이처럼 오랫동안 기록을 남긴 사례가 드물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채 여사는 지금도 매일 저녁 일기와 가계부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1935년생인 그는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고, 여전히 일기와 가계부를 쓸 수 있다는 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일상을 남기겠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