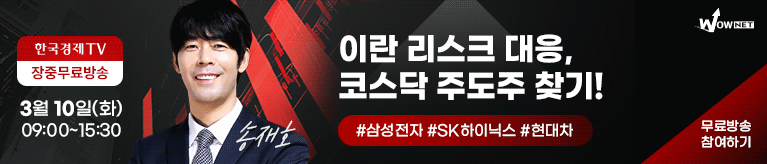지난 19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공연은 이 악단의 실력을 한국 관객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지휘자는 리오 쿠오크만. 홍콩공연예술학교를 나와 줄리어드 음대, 커티스 음악원,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수학한 홍콩 필하모닉의 상주 지휘자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마르세유 필하모닉, NHK교향악단,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해 본 경험이 있다. 국내 관객들에겐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지휘를 맡거나 평창대관령음악제에서 활약했던 모습이 익숙하다. 그와 하모니를 맞출 협연자로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낙점됐다. 이 악단과 선우예권은 지난 18일 광주 공연으로 이미 멋진 공연을 선사한 뒤였다.
웜 톤 악단과 쿨 톤 피아노
악단은 첫 곡으로 진은숙의 ‘수비토 콘 포르차’를 골랐다. ‘갑자기 힘차게’란 뜻의 곡명에 맞게 생동감 넘치는 타악기 소리가 관객들의 주의를 단번에 잡아끄는 5분 분량 작품이다. 한국인 작곡가의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인사한 홍콩 필하모닉은 홍콩 현대 음악가인 찰스 쾅의 ‘페스티나 렌테 질여풍, 서여림’을 한국 최초로 연주했다. 쾅이 스위스 론강에서 녹음한 수중 물소리를 16배 느린 속도로 들으면서 얻었던 영감으로 만든 작품답게 물이 흐르는 소리를 분절한 듯한 타악기 연주가 인상적이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쾅은 6분간의 연주가 끝난 뒤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관객들의 흥이 올랐을 무렵 무대엔 그랜드 피아노가 준비됐다. 이어 지휘자와 함께 선우예권이 웃으며 무대에 나타났다. 연주곡은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닷새 전 같은 자리에서 손열음도 런던 필하모닉과 이 곡을 협연했다. 손열음의 연주에선 안정적이면서 화려한 기교가 돋보였다면 선우예권의 연주에선 박력과 세련미가 느껴졌다. 피아노 소리에 청량감이 담겨 있는 인상이었다. 반면 악단은 따뜻하고 섬세하게 소리를 다듬으며 1악장을 풀어나갔다. 악단 음색이 포근한 웜 톤이라면 피아노 음색은 시원함이 살짝 감도는 쿨 톤이었다.
리오 쿠오크만은 피아니스트를 수시로 봐가며 온도 차를 매력으로 살렸다. 1악장 발전부에서 피아니스트가 독주로 에너지를 쏟아냈을 땐 악단이 이를 그대로 받아내기보단 섬세하고 여린 느낌을 살려 대조를 드러냈다. 조금 느리게 시작하는 2악장에선 악단과 피아노가 나란히 담백하면서 감미로운 분위기를 잘 살렸다. 다만 무대 오른편 벽에 설치된 카메라 이음새에서 나온 덜덜거리는 소리가 옥의 티였다. 이 소음은 A 형식에 해당하는 1부에서 약 2분간 이어진 탓에 비올라나 콘트라베이스 연주자가 뒤를 돌아볼 정도였다.

기백 넘치는 지휘자와 금관
빠르고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3악장은 악단과 협연자 서로가 조금은 달랐던 색감이 멋지게 어우러진 시간이었다. 바이올린과 목관 악기가 녹음이 피어나듯 싱그러운 소리를 내면 피아노가 깔끔한 소리로 초여름 같은 분위기를 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아르페지오도 한 몸이 된 듯 긴밀하게 엮였다. 화려한 피아노 속주를 받쳐줄 땐 악단 전부가 합류해 폭발하듯 소리를 터트렸다. 연주가 끝나자 선우예권은 슈베르트 즉흥곡 3번 내림사장조를 앙코르로 들려줬다. 이 곡을 연주하겠다고 그가 말할 땐 무대 왼편 객석 앞열에서 팬들이 환호성을 쏟기도 했다. 선우예권은 멋쩍은 듯 웃었지만 피아노 의자에 앉았을 땐 담백하고 진중했다.
공연 2부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이었다. ‘운명의 동기’라 불리는 단호한 멜로디가 작품 곳곳에서 얼굴을 비추는 곡이다. 이 작품에서 홍콩 필하모닉은 악기별로 수준 높은 실력을 보여줬다. 현악기는 섬세함을 살려 여림의 정도를 다양하게 바꾸면서도 절정에 치달을 땐 힘을 드러낼 줄 알았다. 목관은 고른 소리를 냈다. 2악장의 오보에와 클라리넷은 현악기의 감미로움에 지지 않고 곡의 주제를 관객에게 각인시켰다. 왈츠 리듬이 깔려 있는 3악장에선 리오 쿠오크만이 콘트라베이스의 피치카토에 맞춰 상반신을 튕기듯 흔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열정적으로 몸을 쓰면서 2시간 넘게 무대에서 그가 보여줬던 기백은 경외감을 주기까지 했다.

백미는 금관이었다. 트롬본과 트럼펫은 적을 겁내지 않는 무사처럼 스스럼없이 우렁찬 소리를 냈다. 공간감을 살짝 좁게 두면서 명료한 음색을 냈는데 다른 악기 소리들과도 잘 어울렸다. 튜바 연주자가 호흡을 쓸 땐 금빛 악기에 반사된 조명이 무대 뒤편에 퍼져 노을빛 윤슬처럼 일렁였다. 관객들을 억눌렀던 운명의 동기가 사라지고 환희가 가득했던 4악장 피날레에선 악단 전체에 역동성이 감돌았다. 단단하게 응집하는 마무리였다. 악단은 바흐의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를 스토코프스키가 편곡한 버전을 앙코르로 연주하며 내한 공연을 마무리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