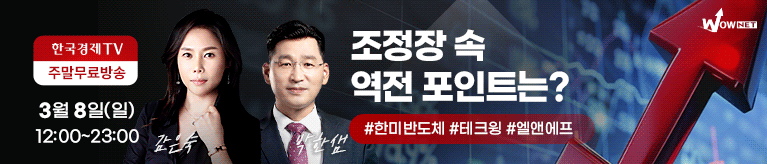13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한·중·일 배터리 기업이 계획대로 공장을 완공하면 내년 글로벌 총생산능력은 실제 배터리 수요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기업은 전기차 시장 성장률을 연 평균 30~40%로 잡았지만 현실에선 10%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급 과잉 시장에선 경쟁사 물량을 빼앗는 것 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중국이 그렇다. 전기차 핵심 시장인 유럽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 물량을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오랜 기간 공급해온 고객사들이 중국 회사로 납품처를 바꾸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보다 한 발 빨리 유럽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기업은 폼팩터를 다양화하고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비중을 높이는 전략으로 고객사 되찾기에 나섰다. 효율이 높은 지름 46㎜ 원통형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를 빠르게 상용화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배제된 미국 시장에선 국내 배터리 3사 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쳐 사실상 ‘출혈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이달부터 7500달러를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까지 폐지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 “이대로면 미국 전기차 점유율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신차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량인데, 이 수치가 5% 미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배터리 수요량으로 따지면 연간 100~200기가와트시(GWh)에 그친다. 250GWh인 미국 공장 생산 규모를 내년까지 약 600GWh로 늘리는 국내 배터리 3사는 공급 과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로봇 등 대규모 신규 수요처가 나오지 않는 한 배터리업계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