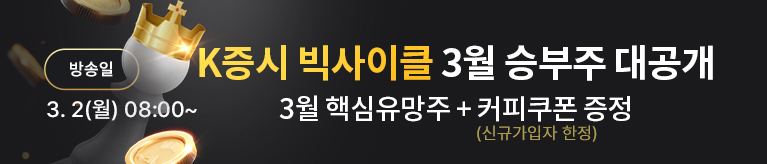추도는 통영 밑이되 약간 서쪽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이다. 배 시간으로 1시간 10분이 걸린다. 거리상 21 Km이다. 위로는 사량도가 있고, 아래로는 욕지도가 있다. 우측 바닷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한산도와 거제도가 있다. 추도를 향해 가다 보면 우리의 남해가 동쪽이든 서쪽이든 다도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웅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섬 요기조기 은폐 엄폐를 잘하고 계시다가 (왜구 편에서 봤을 때) 도깨비처럼 출몰해 한바탕 두드리신 후 다시 섬 뒤로 숨으셨을 것이다. 추도 가는 바다 한가운데서 장군의 숨결을 느끼게 된다. 근데 그건 진짜 그렇다.

추도는 작은 섬이다. 면적 1.6㎢에 불과하다. 등록상 주민은 150명이지만 실제론 80여 명이 산다. 도시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세컨하우스는 보통 때면 대개 비어들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60~70대이다. 농사를 짓고 낚시꾼들을 상대로 낚싯배를 빌려주거나 민박업을 하기도 하며 생계를 이어 간다. 학교는 폐교돼서 빈 건물로 남아 있다. 어디나 그렇지만 애들이 없다. 발전소와 보건소가 있는데 아마도 그건 통영시가 직할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곳에서 영화제까지도 아니고 영화상영회를 한다는 것조차, 처음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 여겼다. 국가 공공기관인 ‘섬 진흥원’이 독려하고 통영시가 예산을 지원하며 영화제 전문 프로덕션인 E&A(대표 조하나)가 주관하는 ‘추도 섬 영화제’는 그렇게 불가능 속에서 시작됐다. 영화제보다는 한국의 이 아름다운 섬을 알리는 데 영화를 활용하자는 생각에 더 방점을 찍었다. 그 과정에서 추도에 들어와 사는 전수일 영화감독(<새는 폐곡선을 그리며 난다> 등)이 큰 도우미 역할을 했다.
추도 섬 영화제는 매년 9월 말~10월 초 2박 3일간 열린다. 올해로 2회째이다. 섬 자체가 낚시 민박업을 하는 만큼 미리 펜션 숙박을 예약받아 외지인들을 유치한다. 이들도 영화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는 김에 영화도 보자는 심정으로 온다. 바다를 배경으로 설치돼 있는 스크린에서 영화 보는 것을 일정에 넣어 놓는 이유이겠다. 그러나 한번 와 본 사람들은 해안에 설치된 야외극장의 낭만을 잊지 못한다.


영화팀들은 추씨네 심야극장을 심야식당과 함께 운영한다. 추도 부녀회는 추도 선셋 다이닝이란 이름으로 밥상을 준비한다. 당연히 모두 다 꿀맛이다. 영화 팀들은 객석을 약 120석 정도 준비한다. 걱정과 달리 객석은 대체로 가득 메워진다. 영화는 단편을 포함해 7~8편 정도 단출하게 준비된다. 올해는 <소년들>의 정지영 감독, 배우 유준상이 방문했다. 섬이 들썩였다. 개막식에는 200명이, 이틀째에는 130명 정도가 참여했다. 점점 많아질 분위기다.

대규모 영화제는 결국 통영에서 해야 할 것이다. 통영에서 크루즈를 동원해 배우들과 감독들을 잔뜩 태우고 추도와 사량도, 욕지도를 해마다 번갈아 가며 방문해 시상식을 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근데 그러다 풍랑을 만나면?, 이라는 말에 앗 뜨거워라, 당분간은 그냥 지금 하는 대로 하기로 했다. 추도를 한번 경험해 보시길. 삶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정말,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다.

추도=오동진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