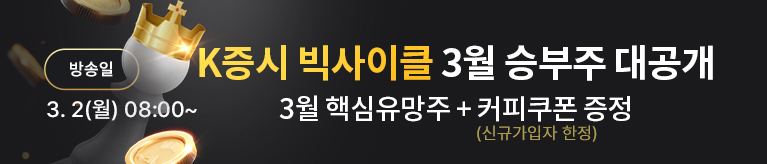소설은 핵전쟁 이후 황폐해진 지구를 배경으로 한다. 인간이 자멸한 뒤 인간과 동물의 혼종 ‘키메라’가 새로운 종으로 등장한다는 파격적인 상상에서 출발한다. 박쥐, 돌고래, 두더지의 특성이 결합한 신인류의 탄생과 그들이 세운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 되풀이되는 갈등과 권력 문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마주하게 한다. 그는 “공상과학(SF)은 재앙을 묘사하는 장르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문학”이라고 강조했다. 베르베르는 “한국은 늘 시대를 앞서가고 독창적인 것에 열려 있는 나라”라며 한국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밝혔다. 그를 서울 합동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만났다.
 ▷출간 직후 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국은 SF 소설이 아주 대중적인 나라는 아닌데도요. 한국에서 유독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출간 직후 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국은 SF 소설이 아주 대중적인 나라는 아닌데도요. 한국에서 유독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해보려고 노력해요. 언제나 독창적인 이야기를 쓰려고 하고, 이미 쓰인 건 다시 쓰지 않으려 합니다. 또 내용이나 스타일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제 책이 사랑받는 건 한국 독자가 새로운 것, 독창적인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한국은 늘 시대를 앞서가는 나라라고 느낍니다. 그런 한국에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죠. 한국만의 지적인 분위기와 교육열은 안타깝게도 프랑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설의 독특한 설정과 핵심 아이디어는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SF의 기능이 해법을 찾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앙을 그리는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제안하는 유토피아적 SF를 씁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이런 결정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키메라의 땅>은 그 해법을 생물학적으로 제시한 작품입니다.”
“SF의 기능이 해법을 찾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앙을 그리는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제안하는 유토피아적 SF를 씁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이런 결정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키메라의 땅>은 그 해법을 생물학적으로 제시한 작품입니다.”▷인간과 혼합할 동물로 박쥐, 두더지, 돌고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종 재난에도 적응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종을 구상했어요. 그리스 신화 속 키메라는 용, 사자, 염소가 섞인 아주 복잡한 존재죠. 인간과 가장 가까운 특징을 가진 동물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동물로는 새보다 박쥐가 우리와 훨씬 닮았습니다. 깃털이 아니라 긴 손가락이 있는 날개를 가졌으니까요. 지진을 피해 공중으로 몸을 피할 수 있겠죠. 돌고래도 물속에서 살지만 포유류고 공기로 숨을 쉬며 아가미와 비늘이 없다는 점에서 인간과 가깝습니다. 쓰나미, 홍수 등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더지는 굴을 파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기에 선택했습니다. 기후 온난화가 극심해졌을 때 강렬한 태양 빛을 피해 땅속에 몸을 숨길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작품은 유전공학과 진화생물학의 색채가 강합니다. 집필 과정에서 어떤 과학적 자료나 연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까.
“저는 예전에 과학 기자였고 지금도 과학자 친구들에게 자주 자문합니다. 인터넷보다 직접 과학자들과 대화하는 걸 선호합니다. 물론 인터넷에도 필요한 자료는 다 있죠.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연구 성과, 발견에 기반을 두려고 합니다. 예컨대 이미 인간·돼지 혼종으로 이식용 장기를 개발하는 실험이 있었잖아요.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인간 DNA와 동물 DNA의 결합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집필할 땐 항상 아이디어와 함께 과학적 설명을 곁들이려고 합니다.”
▷과학과 문학을 자연스럽게 결합하는데, 특별한 글쓰기 방식이 있습니까.
 “프랑스에는 쥘 베른처럼 과학과 문학을 결합한 전통이 있습니다. 과학 기자로 일하면서 ‘대중화’ 작업을 많이 했죠. 저에게 문학과 과학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책을 쓸 때는 늘 아이디어의 씨앗이 있습니다. 시작점, 전개, 그리고 놀라운 결말.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책은 이미 다 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책 한 권 쓰는 데 30초면 충분하다’고 농담하곤 합니다. <키메라의 땅>도 ‘한 여자가 세 가지 인간, 동물 혼종을 만든다’는 상상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그 여자가 연구에 성공해 혼종만 사는 도시가 생성됐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혼종이 사는 도시에서도 결국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되풀이한다’는 발상으로 확장해 나갔죠.”
“프랑스에는 쥘 베른처럼 과학과 문학을 결합한 전통이 있습니다. 과학 기자로 일하면서 ‘대중화’ 작업을 많이 했죠. 저에게 문학과 과학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책을 쓸 때는 늘 아이디어의 씨앗이 있습니다. 시작점, 전개, 그리고 놀라운 결말.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책은 이미 다 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책 한 권 쓰는 데 30초면 충분하다’고 농담하곤 합니다. <키메라의 땅>도 ‘한 여자가 세 가지 인간, 동물 혼종을 만든다’는 상상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그 여자가 연구에 성공해 혼종만 사는 도시가 생성됐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혼종이 사는 도시에서도 결국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되풀이한다’는 발상으로 확장해 나갔죠.”▷이번 소설을 통해 독자들이 어떤 성찰을 하길 바라나요.
“첫째, 모든 동물은 여러 종이 있는데, 인간만 단일 종으로 존재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둘째, 그 때문에 인간은 질병과 재난에 취약합니다. 자연은 다양성을 통해 진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을 단일화하려고 하죠. 인류 역시 호모사피엔스만 남기보다 여러 인류 종이 공존하던 과거처럼 다양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 끝에 남은 건 도롱뇽입니다. 도롱뇽에게 희망을 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홀로틀(axolotl)이라는 도롱뇽은 놀라운 동물입니다. 유일하게 불멸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아홀로틀은 평생 배아 상태로 살면서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자연의 신비죠. 인간·아홀로틀 혼종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방식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세 가지 방식을 먼저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아홀로틀은 멕시코 호수에서 사는 동물인데, 사람들이 잡아먹는 바람에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지, 비관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입니다. 한국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덜 낳는데, 출산율이 낮은 건 아이들에게 교육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아이를 덜 낳고, 낳은 아이는 교육해야 합니다. 한국의 존재 자체가 놀랍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6·25 전쟁 등 위기에서도 올바른 선택 덕에 지금의 번영을 이뤘습니다. 자원도 부족한 나라가 교육만으로 이 정도 성취를 거둔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요.”
▷1991년 <개미>를 시작으로 총 19편의 장편소설을 썼습니다. 왕성한 창작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공지능(AI)도 종종 활용합니까.
“비결이라면 ‘잘 쓰지 못한 초고라도 일단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 나가죠. AI는 자료 수집을 도와주는 정도로 아주 조금만 씁니다. 과학자들과 직접 얘기하는 걸 선호하고, 구글 검색도 많이 활용합니다. 챗GPT도 써봤는데, 제가 쓴 책들을 잘 흉내 내더군요. 하지만 제 무의식까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미래에 제가 쓸 책까지는 예측 못 합니다. 이미 쓴 것을 복제할 뿐이죠.”
설지연 기자
※베르나르 베르베르 인터뷰 전문과 추천 책은 아르떼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