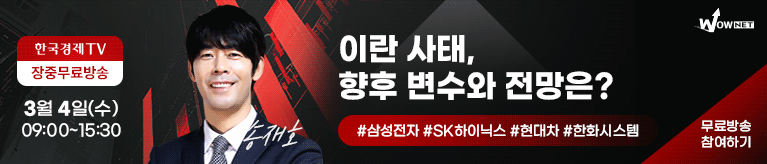“지금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입니다. 성장잠재력이 회복되면 재정 수입도 확충될 겁니다.”
“지금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입니다. 성장잠재력이 회복되면 재정 수입도 확충될 겁니다.”지난달 역대급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된 직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단의 브리핑. 구 부총리가 ‘국가채무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첫 질문을 받고 내놓은 답변이다. AI 등에 투자해 성장이 회복되면 그 돈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의 설명도 일리는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0.9%, 내년 1.8%로 예상한다. 잠재 성장률 2%를 밑돈다. 기재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AI다.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긴 하지만 AI 투자를 위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제 이치대로 씨앗을 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빌리느냐다. 정부는 728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한 해에만 110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찍어낸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적자성 채무가 73%(1029조원)나 된다.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만 1000조원을 넘는다는 의미다. 일시적으로 빌렸다고 하기엔 너무나 큰 숫자다.
이 씨앗들이 미래 성장을 위한 AI 투자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농어촌 수당, 지역사랑상품권 등 각종 현금성 지원책에 들어가는 돈도 수십조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정치권이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지금, 꼭 빌려 써야 하는 씨앗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인 ‘재정준칙’ 논의가 실종된 상황이다.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임기 중 마무리 짓지 못한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거론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재부에서 재정준칙은 사실상 금기어나 다름없어 보인다.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4.0%, 2028년 4.4%다. 기존 재정준칙 기준으로 거론되던 3%를 훌쩍 넘어간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이 아직 법제화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특정 숫자를 사수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한다.
재정준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대외신인도를 민감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 대외신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가 재정건전성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며 지워버리기에 재정준칙의 중요성은 너무도 크다. 나라 곳간지기 최고 책임자였던 역대 부총리들이 왜 이 의미를 강조했는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