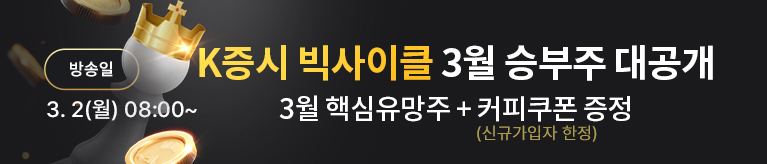지난 19일 옥수수밭에 둘러싸인 경기 용인의 한 기숙학원. 오후 3시가 되자 회색 체육복을 입은 수험생들이 모의고사 시험지를 들고 쏟아져나왔다. 수능 만점자 여럿을 배출한 이 학원은 학생들에게 킬러 문항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실전과 같은 상황을 연출해 ‘문제 풀이 훈련’을 하는 것에 특화돼 있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인재로 불리는 이들이 1년간 자신의 청춘을 반납하면서 이루려는 ‘꿈’은 의대 진학이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혁신 경쟁은 세계 곳곳에서 ‘공학 전쟁’을 촉발했다. 스웨덴왕립공대(KTH)는 원전과 반도체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관련 학과를 부활하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델프트공대는 기계공학의 기초인 정역학(精力學) 과목을 지난해 개설했는데 역대 최다 수강생이 몰렸다. 중국 인도 등 인구 대국의 상위 1% 인재는 모두 공대에 진학하기 위해 인생을 건다.
선진국 중 의대 광풍이라는 기현상이 펼쳐지는 나라는 한국 외에 거의 없다. 2022학년도 이후 줄곧 입시 상위 20위권 학과는 모두 의대다. 전국 수석부터 3058등까지 대부분이 의대로 간다는 얘기다.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내로라하는 수재들은 물리학, 수학, 컴퓨터공학, 전기·전자공학 등에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 원전 등에서 한국을 제조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인적 토양이다.
미국이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도 오랜 시간 축적된 대학의 혁신이 바탕이 됐다. 김성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31일 “미국의 경쟁력은 서부의 공학과 동부의 과학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인 결과”라고 말했다. 스탠퍼드대, UC버클리, 캘리포니아공대 등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이 결합하며 공학적 혁신을 이뤘다면 매사추세츠공대(MIT),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등 동부의 대학들은 미국국립보건원(NIH) 등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바이오 등 장기적 과학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창업자 같은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가 등장한 배경이다.
미국 등 세계의 인재들이 창업 등을 통해 ‘조(兆)원의 승부’를 향해 뛸 때, 한국 인재들은 연봉 4억원(2022년 기준 의사 평균 소득)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근 포스텍 총장은 “의대 열풍은 사회 전체가 예측 가능한 성공에만 집착하는 구조가 만든 결과”라며 “지금은 잘 닦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드는 사람, ‘경계선의 모험가’가 필요한 시대”라고 진단했다. 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은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불확실성’이라고 인식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고재연/델프트(네덜란드)=강경주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