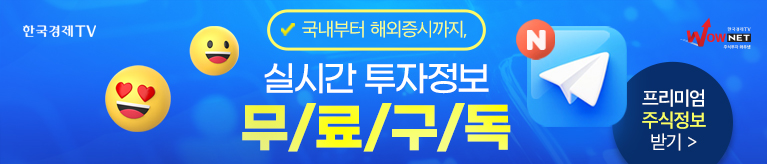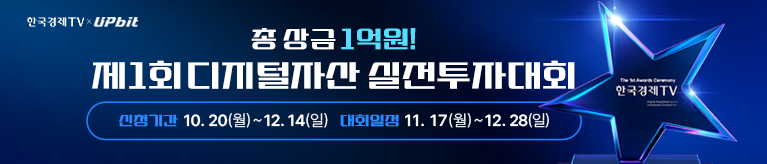2019년 5월 16일은 우리나라 재정 당국자들 사이에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 뚫린 날로 기억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채무 비율 평균이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2주 후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이 45%까지 갈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40%의 빗장이 풀렸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재정 당국은 '국가채무비율 40% 사수'를 금과옥조로 여겨왔다. 유럽연합(EU)이 1992년 체결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를 참가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을 40%로 더 낮게 잡은 것은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지출 10%포인트와 통일 비용 10%포인트를 완충지대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40% 선을 허문 이후 문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17년 34.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퇴임 해인 2022년 45.9%로 치솟았다.
OECD 평균은 100%를 넘는다는 반박도 국가채무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미국과 일본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채무비율이 120%와 230%를 넘는 미국과 일본을 빼면 OECD 평균은 70% 정도로 추산된다.
전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계속해서 빚을 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결코 낮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채비율(54.5%)은 선진국이면서 비기축통화국인 11개 나라의 평균(54.3%)을 처음 넘어섰다.
IMF 등 국제기관들이 국제비교에 사용하는 국가채무비율(D2)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부채비율(D1)보다 2~4%포인트 높게 나타난다.
2024년 말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37%로 272%의 수단에 이어 세계 2위였다.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은 52%로 190개국 가운데 102위였다. 정부 예상대로 2029년 채무비율이 58%까지 치솟으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단숨에 70위권 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40%에 도달하기까지는 18년이 걸렸다. 불과 10년 만에 채무비율이 40%에서 60%에 도달하는 현재 속도라면 일본의 사례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80년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51%였다. 버블(거품)경제가 붕괴하던 1998년에도 116%로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버블 붕괴 이후 무리한 확장재정 정책을 거듭하면서 10년 만인 1998년 부채비율은 181%로 올랐다. 2020년에는 258%까지 치솟았다.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본의 세수는 700조~800조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총지출은 1100조원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총지출과 세수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재정 상황을 '악어의 입'에 비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이 혁신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5년 후면 정부 총지출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린 2026년 예산안이 잠재성장률을 극적으로 반등시킨 착화제였는지, 아니면 악어의 입의 시작점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생존의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를 위해 '현명한 지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