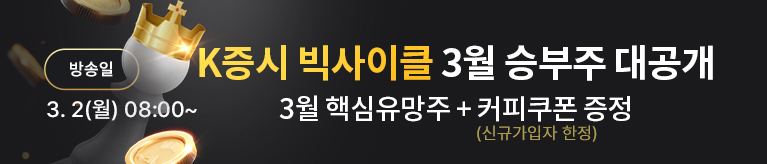중요한 날을 앞둔 한밤중은 길고도 길다. 뒤척이다가 잠을 설친 뒤 새벽같이 떡집으로 향했다. 전날 주문해 놓은 떡 한 상자를 보자기에 싸서 차에 싣고, 자유로를 한참 달려 인쇄소에 도착했다. 첫 책을 인쇄해줄 첫 인쇄소.
중요한 날을 앞둔 한밤중은 길고도 길다. 뒤척이다가 잠을 설친 뒤 새벽같이 떡집으로 향했다. 전날 주문해 놓은 떡 한 상자를 보자기에 싸서 차에 싣고, 자유로를 한참 달려 인쇄소에 도착했다. 첫 책을 인쇄해줄 첫 인쇄소.몇 주 전, 독일에서 인쇄된 외국서 한 권을 들고 무작정 찾아가 책의 색부터 종이까지 쉴 새 없이 묻고, 답했다. 색의 망점을 돋보기로 살피고, 종이의 무게를 재고, 두께를 가늠하며, 양장의 실 묶음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봤다. 인쇄일이 임박한 즈음에도 전화가 수십 통 오갔다. 몇 밀리미터의 변화, 종이 몇 그램의 차이에 관해 이야기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인쇄실로 내려갔다.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 소리, 종이 냄새, 잉크 냄새로 가득한 곳에서 수많은 책이 태어나고 있었다. 몇 달을 고민하고, 여러 번의 밤을 새워 작업한 책의 표지가 인쇄돼 있었고, 그 주변에는 단단한 표정으로 기장님들이 서 있었다. 불안, 두려움, 설렘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던 마음이 한 번에 실타래 풀리듯 풀어졌다. 램프의 요정처럼 팔짱을 끼고 뭐든지 해결해줄 것만 같았던 기장님들의 단단한 표정이 한동안 잊히지 않았다.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인쇄했어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받을 때, 그 책의 초판을 인쇄한 기장님은 그 순간을 기억에 남겨뒀다고 했다. 모든 책이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의 찰나를 항상 함께한다고.
출판사가 저자와 독자를 연결하는 가교라면, 인쇄소는 그 다리에 숨겨진 구조물과 같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가장 기본이자 본질에 가까운 자리에서 묵묵히 책을 지탱하는 사람들. 인쇄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기계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손끝으로 색을 느끼고, 종이를 만져보고, 수천 번 반복된 감각으로 잉크의 농도를 가늠한다. 그 손끝의 감각이 책의 온도를 결정한다. 누군가는 책은 종이와 잉크의 조합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안다. 책에는 ‘시간’이 들어가고, ‘감각’이 들어가고, ‘기억’이 들어간다.
수백 장의 종이를 재단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쌓이는 감각들. 그 감각이 만들어 낸 한 권의 책을 나는 지금도 책장 맨 앞줄, 눈에 띄는 자리에 꽂아두고 있다. 그 책은 그저 첫 출간작이어서가 아니라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책 이전의 책’이기 때문이다. 책을 만드는 가장 마지막 과정. 하지만 어쩌면 책이 ‘비로소’ 되는 가장 첫 번째 순간. 그곳엔 언제나 연금술사들이 있다.
그림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이 깃든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 차분하지만 단호하고, 부드럽지만 재빠른 인쇄소 실장의 수화기 너머 속 목소리는 발을 동동 구르는 출판사들의 바쁜 마음에 바퀴가 되어 굴러간다.
아이디어를 씨앗처럼 틔우고, 작가와 편집자가 단어 하나, 이미지 하나에 마음을 기울이는 동안, 디자이너는 수십 번 레이아웃을 바꾸며 이야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힌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모든 노력의 결실은 인쇄소로 건너간다. 그림과 글은 인쇄소에서 비로소 ‘책’이 된다. 색은 한 톤이라도 빗나가지 않도록 조율되고, 종이는 그림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결을 찾아 선택된다. 잉크는 마르기 전부터 감정을 머금고, 종이는 독자의 손에 쥐어졌을 때 어떤 감촉일지를 상상하며 골라진다.
어쩌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느끼는 감동의 상당 부분은 인쇄의 온도에서 비롯되는지도 모른다. 표지의 촉감, 그림의 깊이, 넘길 때 들리는 종이의 사각거림.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과 눈, 감각과 기술이 함께 만든 ‘연금술’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