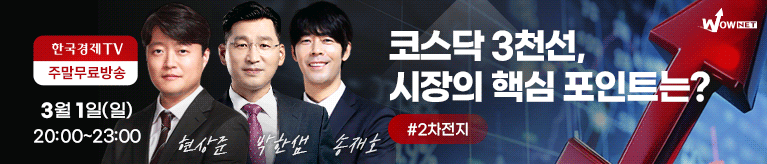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만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 후 급성장한 이케아, 코스트코 등 외국계 유통회사와 다이소, 식자재마트 등 틈새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주말 의무휴업, 출점 시 지역상생협의 의무 등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가구 외 식음료, 생필품까지 다양하게 판매해 복합쇼핑몰과 다를 바 없는 이케아는 법상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 휴업일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이소와 같은 저가형 전문매장 역시 규제에서 자유롭다.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 된다는 조항 덕분이다. 역시 중소 규모 매장을 다수 출점하고 있는 식자재마트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장보고식자재마트는 10년 새 매출이 1500억원대에서 4582억원으로 급증했다.
e커머스 기업도 기존 유통강자를 위협하고 있다.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기업은 24시간 새벽배송, 주말배송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등 규제로 점포 내 제품을 배송하는 데도 제약이 적지 않다. 대형마트 기반 유통기업은 온라인 배송을 위해 별도 법인과 물류 인프라를 새로 갖춰야 했다. 이중 투자 부담을 떠안으면서 롯데마트는 2022년 새벽배송에 이어 지난해 2시간 내 바로 배송 사업을 접었다. 이마트는 수도권 중심으로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조차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로 주변 유동인구가 줄어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고 토로한다. 산본로데오거리상인회는 지난달 초 “대형마트가 주말에 열어야 시장 상권도 살아난다”며 경기 군포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 기한이 끝나는 11월이 다가오면서 국회는 법 손질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등 기존 규제를 강화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은 훨훨 날아다니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했다.
조철오/김유진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