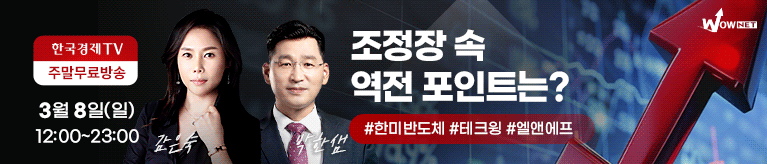“면은 가만히 두면 설 수 없다. 그런데 간단한 접는 행위만으로도 홀로 설 수 있다. 둥글게 말거나 가늘게 찢거나…. 나의 조형 세계는 이런 단순함에 있다.”
“면은 가만히 두면 설 수 없다. 그런데 간단한 접는 행위만으로도 홀로 설 수 있다. 둥글게 말거나 가늘게 찢거나…. 나의 조형 세계는 이런 단순함에 있다.”중견 작가로 이름을 날린 조각가 김인겸(1945~2018·사진)이 1996년 ‘인생 2막’을 맞았다. 프랑스 퐁피두센터 초청으로 10여 년간의 파리 생활을 시작하면서다.
그는 청동, 돌, 나무, 강철 등 재료를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 들었다. 작가를 평생 짓눌러온 무거운 돌과 쇳덩어리의 무게감을 덜어냈다. 평범한 종이 한장을 구부린 모양의 ‘접힌 조각’ 연작이 만년의 역작으로 남았다.
1945년 경기 수원에서 태어난 김 작가는 홍대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조각은 하나의 덩어리’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여러 작은 부품을 조립하는 기법을 초기 연작 ‘묵시공간’에 도입했다. 1995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한국관 개관 기념 작가로 참여했다.
대구 우손갤러리에서 열린 ‘조각된 종이, 접힌 조각’에서 김 작가의 파리 체류 시기 연작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