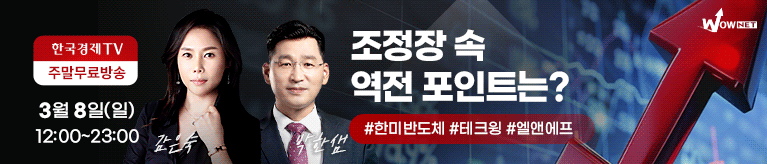2003년 무렵, 방송국 PD인 친구가 미국에서 매스미디어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유학 중 실감한 게 뭐냐는 내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공영방송‘만이라도’ 교양과 윤리의 선(線)을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 미국 방송들,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특히 예능프로들. 선정적인 시청률 장사를 하는 거지. 타락한 레거시 미디어는 돌이킬 수가 없어. 원래 저질이었던 것들보다 악영향도 심각하고.”
2003년 무렵, 방송국 PD인 친구가 미국에서 매스미디어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유학 중 실감한 게 뭐냐는 내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공영방송‘만이라도’ 교양과 윤리의 선(線)을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 미국 방송들,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특히 예능프로들. 선정적인 시청률 장사를 하는 거지. 타락한 레거시 미디어는 돌이킬 수가 없어. 원래 저질이었던 것들보다 악영향도 심각하고.”그 친구는 도덕군자가 아니었다. 제 직업을 고뇌할 뿐이었다. 같은 시기, 방송출연을 ‘즐겨 하는’ 한 정신과의사의 저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서점에 서서 읽다가 구입한 까닭은 유익해서가 아니었다. 왜 이런 황당유치한 책을 썼는지 그 정신과의사를 소설가로서 정신분석해보고 싶어서였다. 책 내용은, 당시 한국 사회의 생존 인물들을 심리분석해 좋은 부류와 나쁜 부류로 나눈 뒤 쌍쌍이 대비시켜 전자는 짓이기고 후자는 칭찬한다. 대상자 면담 없이, 미디어에 포착된 자료들만을 이용해서. 다 떠나서, 정신과의사가 ‘정신과의사임을 내세우며’ 사람을 공개적으로 평가해 조롱받게 해도 되는 일인가?
적군 포로도 치료해주는 게 의사의 실존적 자부심이다. 소방관이 불 속에서 사람을 가려서 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의사로서 명성과 부를 축적하는 게 나쁘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다. 각종 직업들 저마다 나름의 직업윤리가 엄연하다는 뜻이다. 저런 재미없는 책을 소설가가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정신과의사에게는 글재주 부족 이전에 의사 자격 논란 사유다. 게다가, 저 책이 다룬 인물들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가 몇 있었는데, 멀쩡한 사람을 악인으로 비하하고 그 반대 경우도 있었다. 그릇된 존경을 유도하는 죄가 괜한 사람 생매장하는 죄보다 훨씬 크다.
21년 세월이 흘러, 내가 그때의 불쾌한 기억이 다시 떠오른 건, 정신과의사가 말썽쟁이 아동들의 생활 영상을 부모와 함께 보면서 문제해결을 제시하는 TV 예능프로 때문이었다. 결혼생활이 뒤틀린 성인 부부가 자원 출연하는 경우야 백번 양보해 자업자득이라고 쳐도, ‘아동(兒童)’에 대한 정신치료, 행동교정은 부모와 정신과의사의 철저한 보안 속에서 대중에게 노출돼선 안 된다. 불행 중 다행으로, 공개상담 대상이 된 아이가 뭔가 개선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예능프로는 실시간 방영 뒤 유튜브와 온갖 SNS로 퍼져나가 영원히 지울 수 없이 박제(剝製)된다. 성장하는 동안 수십 번도 더 변하는 게 아이고 또 인간이건만, 열다섯 살에도, 이십대에도, 마흔 살에도, 늙어 죽는 그날까지 자신의 어린 날 미성숙한 장면들이 세상에 남아 떠돈다. 잊혀지며 보완되는 삶의 미덕을 강탈당하는 것이다. 이게 치료인가? 이게 부모가 할 짓이고 의사의 본분인가?
혹시나 하여 친분이 있는 정신과전문의 몇에게 내 이런 문제의식이 타당한지 자문을 하니 예외 없이, 만약 자신이 그런 프로그램에 캐스팅 제의를 받는다면 그 순간 즉각 정신과의사로서의 서너 가지 금기(禁忌)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수용 못할 거라고 하더라. 반면, 저 예능 속 셀럽 구루(Guru)가 된 정신과의사는 대중과 ‘선한 영향력 타령에 도핑(doping)된’ 연예인들의 추앙을 ‘다단계로’ 받는다. 아동은 탐욕과 무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선하게 포장된 탐욕스럽고 무지한 것들로부터는 더욱 각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부모의 경솔한 판단 역시 그 경솔한 판단 이외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변호받지는 못한다. 이게 언제나 상식이고, 때로는 법률일진대, 저런 ‘아동심리 서커스’, ‘정신치료 차력 쇼(借力show)’보다 더 어두운 것은 이 사태의 끔찍함을 까맣게 모른 채 저것들을 멀쩡히 즐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신앙처럼 떠들어대던 PC(정치적 올바름)는 전부 어디에 팔아먹었단 말인가.
오늘날 미디어의 선정적 상업주의는 21년 전 미국 예능처럼 순박(?)하지 않다. 휴머니즘으로 양악수술을 하고 나타나 ‘남의 불행 쇼’의 은밀한 중독자인 소비자들을 양산한다. 이런 ‘위선적 부조리’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다. 가령, 아이들을 ‘어린이 활동가’로 임명하는 정치인과 그걸 뿌듯해하는 부모는 호러물이다. 애들 걱정할 때가 아니다. 어른들이 제정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