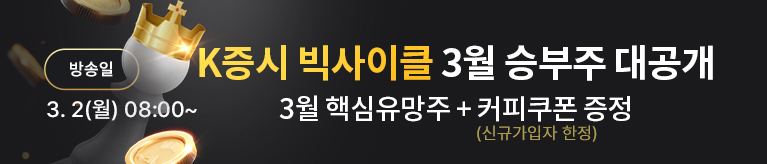임윤찬이 미국 뉴욕필하모닉과 뉴욕링컨센터 데이비드 게펜홀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에 걸쳐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연주했다. 밴클라이번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임윤찬은 이제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지난봄 카네기홀 데뷔 리사이틀에서 쇼팽의 24개 연습곡을 연주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고, 데카 레이블에서 발표한 쇼팽 음반을 통해 그라모폰 음반상과 디아파종 황금상을 연이어 받았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젊은 피아니스트의 시선으로 본 쇼팽이 새로운 해석의 길잡이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쇼팽 협주곡 2번은 카타르시스가 폭발하며 관객들의 환호가 터져 나오는 곡은 아니지만 그 어떤 곡보다도 내면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싱그럽게 꽃피는 작품이다. 협주곡은 독주자가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지분은 함께 무대에 오르는 상대에게 달려 있다. 이 부분이 솔로 연주자에게 득이 될 수 있지만 필연적인 상대와의 호흡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작년 5월에 이어 뉴욕필하모닉과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춘 임윤찬의 연주에서는 대비의 미학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29일 공연에서 임윤찬은 단순히 음표를 연주하는 것을 넘어 곡의 구조와 정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때로는 더욱 또렷하고 명료하게 톤을 부각하다가, 각진 음들을 말랑말랑하게 뭉개는 몽환적 장면에서는 더욱 흐릿하게 조절해 작품의 음영을 세심하게 조명했다. 완급 조절이 극적으로 드러나 마치 진공 상태에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블랙홀처럼 강력한 중력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듯 임윤찬은 자신의 연주를 통해 그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섬세함의 극치를 보여준 2악장에서는 마치 살얼음판 위에서 균형을 잡고 걸어가는 듯한 아슬아슬함이 느껴졌다. 극적 표현을 양보하고라도 소리가 안정되게 내려앉는 느낌을 조금 더 살렸으면 어땠을까. 3악장은 첫 두 악장과는 달리 피아노 솔로가 먼저 시작한다. 지휘봉을 잡은 가즈키 야마다는 쇼팽을 지휘하는 내내 솔리스트를 앞서나가거나 몰아세우지 않았고 오케스트라를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았다. 임윤찬이 차안대를 한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구간은 물론, 루바토가 극적으로 표현한 지점까지 세밀하게 호흡을 맞춰갔다.
3악장을 마치자 관객 2000여 명의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그는 무대를 여러 차례 오가며 커튼콜로 화답했다. 앙코르로 연주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주제 부분을 끝내고 한 소녀 관객이 무대 앞으로 다가가 수줍게 건넨 선물을 받는 순간까지도 그의 얼굴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신들린 듯 음악에 몰입한 모습만큼 여정을 마친 후의 여유 있는 미소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2부에서 연주된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에서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중시하는 지휘자의 성향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1악장의 금관악기군과 팀파니가 호령하는 부분의 임팩트가 아쉬웠고, 꿈결 같은 3악장의 클라리넷 솔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다. 4악장에서는 충분히 달아오르지 않은 채 터뜨린 듯한 부분이 있었다. 이 작품은 피아노 협주곡 2번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다. 힘들고 무겁게 헤쳐가는 과정에서 모인 에너지를 소모하며 서사를 풀어야 한다. 흠잡을 데 없는 호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목적지에 너무 쉽게 도달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임윤찬의 연주에 앞서 이뤄진 1부 첫 번째 작품은 다이 후지쿠라의 ‘얽힘(Entwine)’이었다. 빠르고 리드미컬한 파편들이 세포분열을 일으키듯 반복적으로 얽혀 뻗어나가는 장면에서는 필립 글라스나 존 애덤스의 구조적 동질성이 엿보였다. 마치 가장 일본적인 풍경을 가장 서양적 언어로 구사한 다케미쓰 도루의 진화된 모습을 보는 듯했다.
뉴욕=김동민 아르떼 객원기자·뉴욕클래시컬플레이어스 음악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