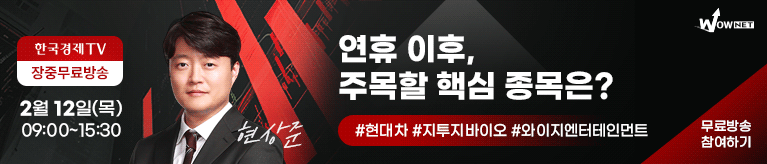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내에 취업한 중국 국적 동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317억원,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는 341억원이다. 낸 돈보다 24억원을 더 받아 간 것이다. 고용허가제 대상으로 국내에 취업해 이직이 제한되는 베트남, 필리핀 출신 근로자의 납부액 대비 수령액 비율이 20~30%대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상대적으로 이직이 용이한 중국 동포들이 한국 실업급여의 ‘단맛’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격차다. 일본 국적자의 수령액 비율도 99%가 넘는다. 한국의 실업급여가 ‘글로벌 호구’가 된 셈이다.
국내 근로자 중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도 지난해 11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였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세후로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높다.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쉬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무제한 반복 수급이 가능하니 “못 타 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 탓이다. 얌체 수급자를 걸러내는 건 틀어막으면서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허탈감은 나 몰라라 한다. 중소기업은 일손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정작 일할 곳이 없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급증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