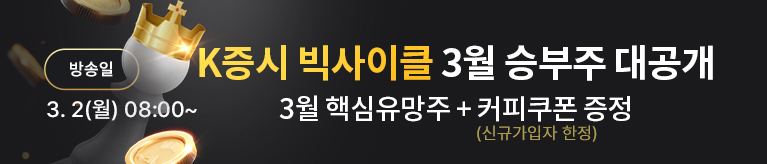인류의 삶을 바꾼 결정적 분기점은 무엇일까. 역사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대체로 정치와 경제, 안보 같은 ‘하드파워’의 관점에서 답을 받아 간다. 지난 세기 세계사의 흐름을 짚을 때 두 차례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냉전, 석유 위기 같은 사건들이 먼저 거론되는 이유다.
인류의 삶을 바꾼 결정적 분기점은 무엇일까. 역사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대체로 정치와 경제, 안보 같은 ‘하드파워’의 관점에서 답을 받아 간다. 지난 세기 세계사의 흐름을 짚을 때 두 차례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냉전, 석유 위기 같은 사건들이 먼저 거론되는 이유다.그런데 역사의 행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2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비슷한 시기 17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1차 세계대전보다 많다. 약 100년 후 코로나19는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미생물은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환희를 안겼다. 가장 중요한 ‘먹을 것’부터가 그렇다. 인간이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종교와 예술을 발전시킨 술과 빵은 모두 효모라는 미생물의 활동 덕에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흑사병이란 이름으로 중세 유럽을 휩쓸며 최소 1억 명을 죽음으로 내몬 페스트균은 귀족과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려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실마리가 됐다.
신간 <역사가 묻고 미생물이 답하다>는 “성경에선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했지만, 지구의 태초엔 미생물이 있었다”고 말한다. 인류가 등장하기 전 수십억 년 동안 지구는 미생물로 덮여 있었다. 인간은 등장 시점부터 미생물과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 미생물을 이용하거나 때론 협력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곧 인류 역사였다.
책은 다소 낯선 존재인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 사건을 곁들여 쉽고 재밌게 풀어낸다. 고대 그리스나 중세 유럽 같은 과거의 어렴풋한 이야기뿐 아니라 19세기 영국 런던에서 창궐한 콜레라가 현대적인 도시 정비 시스템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 등 비교적 최근에 기록된 질병의 발자취까지 되짚으며 흥미를 돋운다.
단순히 흥미성 스토리텔링에 그치지 않는다. 책은 미생물이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도 초점을 맞춘다. 푸른곰팡이로 페니실린을 만들어 수많은 생명을 살린 이야기나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인 리스테리아균으로 면역체계를 활성화해 췌장암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는 최근 연구 등을 소개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미생물을 ‘무서운 것’으로만 치부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미생물로 사람이 위협받은 것도, 그것을 이용해 유용한 것을 만들어낸 것도 모두 인간이 한 일이었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에서 항생제 내성세균을 연구하는 저자는 “미생물을 이용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다”며 이렇게 말한다. “결국은 사람이 답한다. 미생물을 통할 뿐.”
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