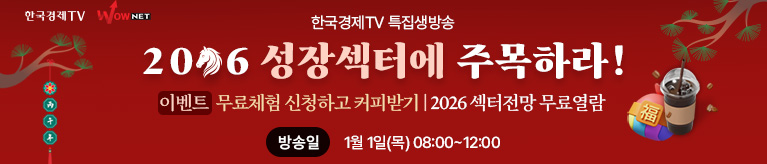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은 대규모 전력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 생산지가 지방에, 수요지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다.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송전망이 부족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8.9%다. 경기도 전력 자립률이 61%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력 자립률이 10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뿐이다. 대전(2.9%), 광주(8.4%), 충북(9.4%), 대구(15.4%) 등은 전력 자립률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전력 자립률은 지역의 전력 소비량 대비 발전량을 뜻한다.
전력 자립률이 낮은 지역이 전기를 쓰려면 지방에서 장거리에 걸친 송전선로를 통해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문제는 송전선로 신설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이 매우 낮아 설치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동해안권에서 경기 가평 등으로 이어지는 8GW 규모 초고압 직류 방식 송전선로(HVDC)는 2019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 일정이 미뤄졌다. 송전탑 등 혐오 시설 설치에 주민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에선 송전선이 없어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진다. 정부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 등 대용량 전기 사용업자로부터 지방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법을 제정한 배경이다.
정부 관계자는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 공급·수요를 적절하게 맞춰 배분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중요 첨단시설의 전기 공급이 여의치 않아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