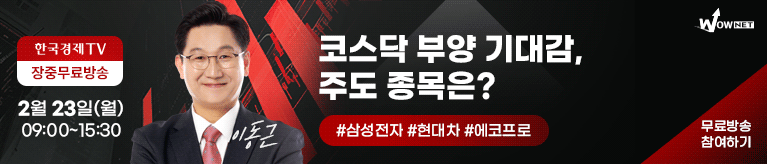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6년부터 상장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잠재적 피해 규모를 추정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규제에 따르면 농업·임업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재해로 인한 피해 예상치를 공시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홍수나 산사태에 따른 기지국 피해 예상 규모, 유통 기업은 허리케인으로 발생한 시설물 파손과 매출 감소 등 피해 가능성을 공시해야 한다.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폭염 같은 극한 기후 추세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분석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된 것은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자연재해가 기업 경영에 큰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신용평가사 AM베스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재보험 등 주택 보험을 제공한 미국 보험사들이 지난해 152억달러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 이후 최악의 손실이며 전년도의 두 배 이상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재난이 빈번한 지역에서 아예 철수하거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인구가 급증하는 곳에선 자연재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6개 주의 인구 증가 폭은 2010년대 늘어난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로버트 고든 미국 손해보험협회 수석부사장은 FT에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며 “건설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해 주택 수리·재건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 이변에 따른 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요 대형 자연재해는 37건으로 10억달러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탄소 배출 규제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0월 최초로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기후공시 의무를 법제화했다. 유럽연합(EU)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수소·비료·전기 등 6개 수입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