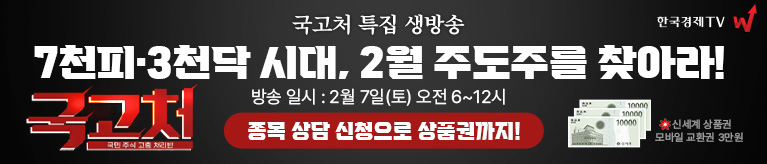문제는 고용 연장 방식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랬고 지난달 말 계속고용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같은 목소리였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어제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선 노동계의 주장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요셉 KDI 부연구위원은 노동구조가 대기업 근로자와 정규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년만 강제로 연장하면 혜택이 이들에게 집중된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청년들은 오히려 고용 감소를 겪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호봉제에 대한 부담으로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는 기업이 적잖은 만큼 고용 연장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정년을 두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국과 유럽은 정년이 연령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것이어서 정년 자체를 폐지했다. 일본마저 지난해부터 기업에 65세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 65세 정년’은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기업이 고령자 고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택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정년퇴직 후 2년 재고용’이 좋은 사례다. 임금은 줄더라도 생산직 근로자가 원하면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도 정년 연장만 외칠 일이 아니라 노사가 윈윈하는 제도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