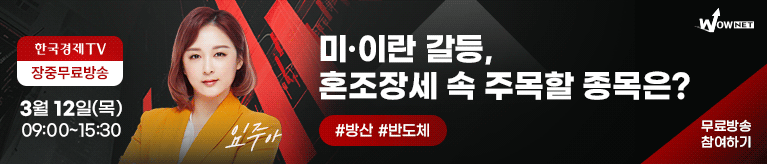골프클럽 14개 가운데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선수를 쉽게 영입할 수 없는 클럽이 퍼터다. 선수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른 데다 한번 감을 익힌 퍼터를 바꾸는 데는 너무 큰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신제품이라고 해서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9·미국)는 나이키, 테일러메이드 등과 클럽 계약을 하면서도 퍼터는 스카티카메론 뉴포트2 하나만 썼다. 이 퍼터로 메이저 대회 15승 중 14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우승 부적’ 같은 퍼터
 이처럼 보수적인 퍼터 시장에 최근 선수들이 먼저 시타를 요청하는 퍼터가 있다. 2018년 시장에 첫선을 보인 랩(L.A.B) 브랜드의 퍼터다. 1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CC(파70)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소니 오픈 최종라운드 연장 1차전에서 그레이슨 머리(31·미국)가 12m 버디퍼트를 성공한 순간, 그의 손에 쥐고 있던 클럽이 바로 이 퍼터였다.
이처럼 보수적인 퍼터 시장에 최근 선수들이 먼저 시타를 요청하는 퍼터가 있다. 2018년 시장에 첫선을 보인 랩(L.A.B) 브랜드의 퍼터다. 1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CC(파70)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소니 오픈 최종라운드 연장 1차전에서 그레이슨 머리(31·미국)가 12m 버디퍼트를 성공한 순간, 그의 손에 쥐고 있던 클럽이 바로 이 퍼터였다.라이 앵글 밸런스(Lie Angle Balance)의 이니셜을 따 만든 랩 퍼터는 헤드 중앙에 샤프트를 끼운 것이 특징이다. 라이 각이 완벽하게 밸런스를 이뤄 진자 동작으로 스트로크할 때 퍼터 헤드가 뒤틀리지 않고 정확한 임팩트로 이어지게 한다는 게 제조사의 주장이다.
헤드 중심에 샤프트를 꽂는 기술(센터 샤프트)은 이미 기성 브랜드들이 선보인 바 있다. 테스트 결과값 역시 환경 설정에 따라 입맛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신뢰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최근 PGA투어 선수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탄 것은 이를 통해 ‘인생 역전’을 이룬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애덤 스콧(44·호주)이 들고나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랩 퍼터는 지난해 2승을 거두며 ‘제2의 전성기’를 연 루카스 글로버(45·미국)가 사용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여기에 스콧의 권유로 이 퍼터를 든 카밀로 비예가스(42·콜롬비아)까지 9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재기를 노리는 선수들의 ‘우승 부적’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비예가스는 “이 퍼터를 쓰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다”고 했다. 이날 연장전에서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한 안병훈(32)도 지난해부터 랩 퍼터에 ‘롱 샤프트’를 끼운 뒤 올해 2개 대회 연속 ‘톱5’에 들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랩 퍼터를 쥔 머리는 이번 대회 그린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퍼팅 이득 타수(-0.665타)가 투어 평균보다 낮았던 그는 이번주 퍼팅 이득 타수 2.810타(29위)로 활약했다.
○단종됐다가 부활한 퍼터도
공교롭게도 이날 연장전에서는 또 다른 ‘행운 부적’ 같은 퍼터가 랩 퍼터와 승부를 펼쳤다. 머리와 마지막까지 우승을 다툰 키건 브래들리(38·미국)가 사용한 캘러웨이 오디세이 브랜드의 ‘제일버드’ 퍼터다. 2014년 출시 이후 인기가 없어 일찌감치 단종된 비운의 제품이다.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이 퍼터가 본격적으로 관심받기 시작한 건 지난해 메이저대회 US오픈부터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윈덤 클라크(31·미국)를 시작으로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브래들리, 로켓 모기지 클래식에서 리키 파울러가 제일버드를 들고 우승해 큰 화제를 모았다. ‘한물갔다’는 평을 듣던 선수들이 연달아 우승컵을 들어 올리자 ‘퇴물 퍼터’는 위상이 ‘마법의 지팡이’로 격상했다. 오디세이는 폭발적인 인기를 무시하지 못하고 단종된 제일버드를 한정판으로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마법 지팡이 퍼터의 도움으로 우승을 거둔 머리는 말 그대로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 2017년 버바솔 챔피언십 이후 7년 만에 거둔 우승으로 상금 149만4000달러(약 19억3000만원)와 함께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출전권과 총상금 2000만달러가 걸린 PGA투어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까지 확보했다. 머리는 “인생과 골프를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며 “쉽지 않았지만 노력의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